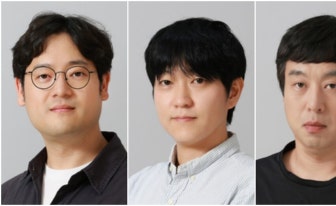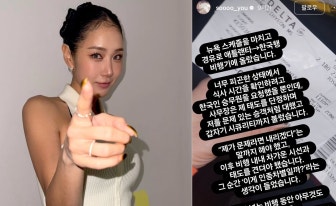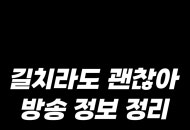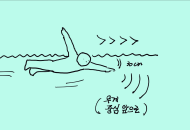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한 지 14일째인 2025년 10월9일 아침 6시 기준, 대전 본원에 있던 전체 시스템 709개 가운데 193개가 복구됐다. 이용률과 중요도가 높아 1등급 서비스로 지정된 36개 시스템 가운데 22개는 여전히 중단 상태다. 대표적으로 ‘국민신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이 아직 복구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전문인력 200여 명을 포함한 1천여 명이 연휴 내내 복구에 매달렸다. 그럼에도 주요 서비스 복구까지는 한 달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화재 피해가 집중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의 분진 제거가 쉽지 않다는 현장 증언이 나온다. 숯이나 활성탄 등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탄화 입자가 전산실을 뒤덮어 분진 제거가 어렵고, 장비 틈새에 침투한 입자를 제거하려면 특수 용제를 사용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복구 과정을 총괄하던 행안부 소속 4급 공무원 ㄱ씨가 10월7일 세종청사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등에 따르면, ㄱ씨는 연휴와 주말 없이 이어진 초과노동과 이후 대응 업무를 처리하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ㄱ씨의 죽음은 과로와 업무 관련 사망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돼야 마땅할 듯하지만, 현행 공무원 재해보상법은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의 경우 업무 인과성이 ‘확정적 동기’로 입증돼야만 산업재해로 인정한다.
화재 사고는 원인과 예방책을 따져 재발 방지책을 만들면 된다. 하지만 사고가 난 시스템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은 또 다른 비극이다. 재난 이후,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과중한 일정과 보고 체계의 압박 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하는 까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