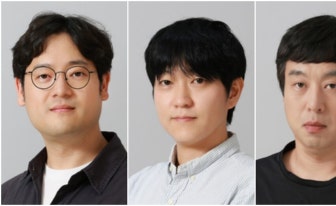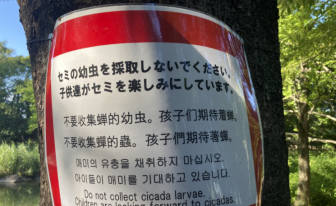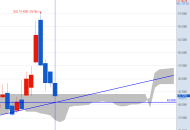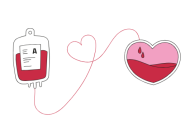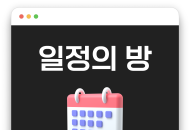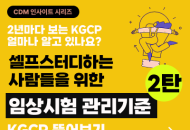“민하한테 패스해야지!” 햇살이 따사로운, 때로는 뜨거운 토요일 오후마다 딸아이가 주 1회 다니는 축구교실 앞에서 한가로이 휴대전화를 했다. 여느 때처럼 평화롭게 나무 그늘에 있는데 코치의 화난 듯한 목소리가 들렸다.
“민하한테 패스하라고!”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딸아이는 1학년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동네 축구교실에 다녔다. 공 차는 걸 좋아했다. 아이가 먼저 좋아했는지, 어릴 때 공 찰 생각을 못했던 엄마가 ‘축구 한번 해볼래?’라고 먼저 물었는지는 모르겠다. 아이는 한 번 가보더니 신나 하며 즐겁게 축구교실에 다녔다.
휴대전화에서 고개를 들어 딸아이가 뛰는 경기장을 보니 뛰는 아이 10여 명 중 단 2명만 여자였다. 1학년 때는 절반은 됐는데, 2학년 때도 5명은 됐는데…. 4학년이 되니 2명으로 줄었다. 그리고 그 여자아이 둘에게 남자아이 9명은 공을 주지 않고 자기들끼리 주고받으며 골문을 오가고 있었다.
축구교실에 여학생반을 만들어달라고 했더니 “4학년부터는 여학생이 별로 없어요”라는 말이 돌아왔다. 여자아이끼리 하는 축구교실을 찾았지만 집 근처에 가깝게 다닐 수 있는 곳이 없었다. 딸은 이후 몇 번 더 가더니 자연스레 축구교실을 관뒀다. 축구 대신 피구, 배드민턴, 태권도를 즐겨 한다.
아이는 “그냥 하기 싫어서”라고 했지만, 한 해 뒤 여성 풋볼 기획팀 ‘너티FC’가 주최한 엄마-딸 축구교실 행사에 같이 갔더니 신나게 공을 찼다. 경기도 광명시에서 한 행사에 경기도 양평, 대구, 서울 동작구 등 전국에서 공 차는 엄마와 딸이 왔다. 다들 ‘동네’엔 뛸 곳이 부족하다며 신나게 뛰었다.
‘왜 운동장을 찾아다녀야 하지?’ 분한 마음이 여자축구를 살펴보게 했다. 살피면 살필수록 여자아이들의 운동장이 여전히 좁다는 사실에, 심지어 축구를 전문으로 하는 여자축구 선수들의 운동장도 평등하지 않다는 사실에 기사 쪽수가 점차 늘어났다. 급기야 128쪽짜리 통권호(한 권 전체를 하나의 주제 기사로 채우는 잡지)가 됐다.
취재에 응해준 여자축구 학생 선수들이 축구에 대해 말할 때면 눈빛이 빛났다. “골 넣는 게 재밌다” “상대 선수가 슈팅 때렸을 때 막으면 성취감이 정말 좋다” “수비하다가 공 뺏을 때 최고다” “골을 막을 때 내가 너무 멋있다”고 말했다. 부모들은 조금 더 현실적인 ‘연봉’과 ‘비전’,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내 딸이 미쳐 있으니, 나도 미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운동장은 넓디넓은데 특정 성별을 이유로 누군가에게만 좁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축구를 말할 때 한없이 빛나는 아이들이 성인 선수가 됐을 때는 더 뛰기 좋은 운동장이 돼야 한다는 바람이 한국 사회 전체에 가닿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