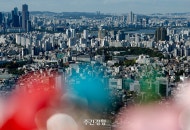정당에 관한 고전적인 이해에 따르면 자유주의, 사회주의, 보수주의 같은 이념이 정당의 정체성을 규정한다. 자유주의자와 사회주의자는 서로 대립하지만, 각각 ‘사회주의 아님’과 ‘자유주의 아님’을 자기 정체성으로 삼지는 않는다. ‘우리는 자유주의자다’가 정체성이고, 이로부터 ‘우리는 사회주의에 반대한다’가 논리적 귀결 중 하나로 나올 뿐이다. 반면 한국의 정치 공간에서 각 세력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무엇임’이라는 긍정성이 아니라 ‘무엇 아님’과 ‘무엇에 반대함’이라는 적대적 부정성이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을 반대하는 정당’으로 존재한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양쪽 모두 자기 존재의 이유를 ‘저들의 집권을 저지하기 위해서’에서 찾는다. 이 두 정당이 싸우는 모습을 보고 ‘이념 대결’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많은데, 정작 그들의 정치이념이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는 단순히 ‘네거티브 전략’ 따위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집단의 정체성 자체가 부정성으로 구성된다는 의미다. 이런 상황에서는 흥미로운 일이 벌어진다. A와 B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B 아님’과 ‘A 아님’이 대립한다. 이곳에 A와 B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없으므로, ‘B 아님’과 ‘A 아님’은 다시 ‘A 아님이 아님’과 ‘B 아님이 아님’으로 표현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A와 B의 자리에 각각 ‘B 아님’과 ‘A 아님’을 계속 넣어보자. ‘아님의 아님의 아님…’이라는 형식이 무한히 계속된다.
이는 논리적 유희를 위한 농담이 아니다. ‘저들을 싫어하는 사람 모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우리’를 상상해보자. ‘우리’의 정체성은 오로지 ‘저들’을 반대하는 데서 성립한다. 그런데 ‘저들’ 역시 자기 정체성 없이 ‘우리’를 반대하는 진영으로만 형성돼 있다. 그럼 ‘우리’가 반대하는 대상은 ‘우리를 싫어하는 진영’이고, ‘우리’는 곧 ‘우리를 싫어하는 진영을 싫어하는 진영’이 된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는 상대편을 반대할 수가 없다. ‘저들’과 ‘우리’를 생각할 때마다 ‘아님의 아님의 아님…’ 또는 ‘반대의 반대의 반대…’ 같은 무한 왕복에 갇히기 때문이다. 결국 ‘저들’을 반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저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해 주어야만 한다. ‘저들’도 ‘우리’를 반대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
이때 정체성 부여란 반대를 위한 낙인찍기의 성격을 가진다. 현재 주류 양당의 관계가 이렇지 않은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당 자신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낙인찍기다. 이들이 그동안 사용해온 ‘친북좌파’ 따위의 말을 떠올려보자. 국민의힘 역시 자신을 긍정적으로 규정할 방법이 없다. 이들의 정체성을 부여해 주는 것은 민주당이 사용하는 ‘내란 세력’ 같은 말이다. 부정성의 논리에 내포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여기에 있다. 한쪽 진영의 존재 이유와 정체성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적대적 공존’이나 ‘적대적 공생’은 이런 관계를 설명하기에 불충분하다. 앞서 설명한 것은 각 진영이 상대 진영과 적대적으로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 아니라 상대 진영 없이는 자기 진영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부정성이 지배하는 정치 공간의 또 다른 특징은 양자 구도에 있다. 공간 전체가 반드시 두 진영으로만 나뉘고, 삼자 구도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A와 B가 대립하고 있는 공간에 C가 등장하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이 새로운 세력도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에 반대함’으로 규정해야 한다. 그러나 A를 반대할 수는 없다. 그러면 B와 같은 편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B를 반대할 수도 없다. 따라서 C가 존속하려면, A와 B 모두를 반대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두 진영을 하나의 AB 진영으로 통합시키고, 여기에 반대하는 새로운 진영을 형성해야 한다는 말이다. 만일 C가 실패하면 ‘A vs B’라는 기존의 양자 구도가 유지될 것이고, 성공한다면 ‘AB vs C’라는 새로운 양자 구도가 형성될 것이다. 즉 삼자 구도는 불가능하고 어떤 경우든 양자 구도로 수렴한다.
현실 정치에 제3정당이 등장할 때를 상상해보자. 그들이 ‘국민의힘 반대’를 자기 정체성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그럼 민주당에 흡수될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민주당 반대’를 택할 수도 없다. 결국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모두 반대하는 정당’, ‘거대 양당에 반대하는 정당’ 같은 형식을 취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하나의 진영, 예를 들어 ‘낡은 정치세력’ 따위로 뭉뚱그리고, 자신을 그에 반대하는 진영으로 위치 짓는 것이다.
문제는 기존의 주류 양당을 하나로 통합시킬 정도로 강력하고 거대한 제3세력이 등장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군소정당이 종종 등장했지만, 대부분은 제3정당을 형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존 정당 내부의 주도권 싸움을 위한 것이었다. 유일하게 ‘진보정당 운동’만이 고유한 의미의 제3정당을 추구해왔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정의당이 놓여 있던 딜레마 상황은 부정성의 논리에서 곧바로 발생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반대’를 하면 민주당에 흡수되고, ‘민주당 반대’를 하면 국민의힘과 한통속으로 몰린다. 그렇다고 양당 모두를 반대할 역량은 없다. 정치 공간의 기본 논리가 전복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제3정당은 계속 실패하고 거대 양당이 번갈아 가며 집권하는 상황이 지속할 것이다.
왜 한국의 정치 공간은 부정성의 논리가 지배하는가? 긍정적 정체성에 기초한 정치세력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긍정적 정체성을 구성할 정치이념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 왜 정치이념이 없는가? 이념을 구성하는 합리적이고 개념적인 언어는 거부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만 통용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또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다 보면 한국 근대와 민주주의의 문화적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불변의 기본 조건’처럼 간주하던 것들을 바꾸지 않는 한, 그 어떤 진전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