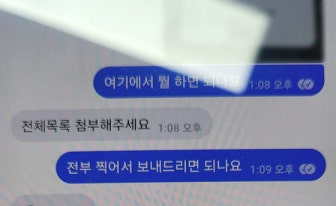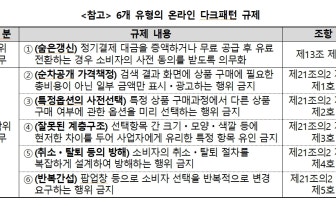김창희 지음 푸른역사 | 316쪽 | 2만2000원
“여드레 스무날엔/ 온다고 하고/ 초하루 삭망이면 간다고 했지/ 가도가도 왕십리 비가 오네.”
김소월이 1923년 발표한 시 ‘왕십리’의 한 구절이다. 김소월은 왕십리에서 하숙을 하며 작품활동을 했다고도 알려져 있다. 현재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소월아트홀도 이 같은 김소월과 왕십리의 인연으로 이름 붙여진 것이다.
그런데 왕십리에는 김소월처럼 유명한 시인 외에도, 수많은 이름 없는 이들의 사연이 잠들어 있다. 저자는 왕십리에 ‘자기 삶의 한 조각을 떨구고 간’ 22인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택견 명인, 만담가, 독립운동가 등 저마다 삶의 모습이 다양하다.
오늘날 왕십리역은 지하철 2·5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교통의 요지다. 그런데 조선시대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고 한다. 당시 광희문 밖을 왕십리로 통칭했는데, 밭작물을 재배하던 농경지 아니면 공동묘지였다. 그래서 광희문은 ‘시구문’(시체를 내가는 문)으로도 불렸다. 그러다 보니 왕십리는 유독 마지막과 연관된 사연이 많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은 가운데 숨을 거둔 소설가 김동인, 갑신정변에서 결정적 역할을 했다가 끌려가던 도중 군중의 돌팔매에 숨진 무수리 고대수의 이야기가 그렇다.
생각지 못한 왕십리 역사도 알게 된다. 왕십리는 우리나라 택견의 중심지라고 불러도 좋을 만큼, 택견 수련생이나 대항전을 펼치는 이들이 모여든 곳이었다고 한다. 그러다 일제강점기에 명맥이 끊겼다.
왕십리에 대해선 조선 초기 도읍지를 찾으라는 명을 받은 무학대사가 “10리를 더 가라”는 가르침을 받은 이야기 정도가 떠오른다면, 이 책을 추천한다. 왕십리가 더욱 궁금해질지도 모른다. 저자는 왕십리 사람들이 발굴의 손길을 기다린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