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겐 의사가 신이에요. 어떻게 정리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복귀했다고 하니 안심은 되죠.”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암 검진을 받으러 온 이모씨(65)는 1년7개월 만에 병원에 돌아온 전공의들을 보면서 이같이 말했다. 병원은 전공의들이 다시 현장에 복귀하며 바쁜 일상을 되찾은 듯 했다. 이씨와 같은 환자들은 “마음이 놓인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서울대병원은 환자와 보호자, 의료진, 직원들로 붐볐다. 로비 곳곳에선 흰 가운을 입은 전공의들이 두세 명씩 짝지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환자들은 안도감을 드러냈다. 김모씨는 “세 달에 한 번씩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주치의가 한 명뿐이라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그동안 무한정 밀리다 보니 병원이 도떼기시장처럼 어수선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남편 조모씨(68)는 “(아내가) 응급실에 왔을 때 오전 9시에 와서 저녁 7시까지 하루종일 기다린 적도 있다”며 “중증 환자라 받아준 것만도 다행이었지만, 10시간을 버티는 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서울 중구 강북삼성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는 아이의 어머니 이모씨는 “케모포트나 히크만 카테터(항암치료 환자가 혈관에 삽입해 두는 특수 주사관)로 채혈을 해야 하는데, 파업 땐 인턴 의사가 없어 대기 시간이 너무 길었다”며 “오늘은 확실히 빨라져서 아이도 저도 훨씬 편하다”고 말했다. 복부 초음파와 CT 촬영을 하려고 8개월을 기다렸다고 밝힌 환자 A씨는 “전공의들이 아직 적응 중인 건지, 오전 혈액검사가 누락돼 금식을 오후까지 해야 한다”며 불편을 호소하면서도,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 많이 보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인다”고 했다.
전공의들은 곧바로 업무에 뛰어들었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공의 B씨는 “일하느라 정신이 없어 1년 반의 공백을 느낄 새가 없다”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전공의 C씨도 “병원에 남았던 전공의들과 어색할까 봐 걱정도 됐는데, 돌아오니 막상 바빠서 신경 쓸 겨를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갑지만은 않다”는 목소리도 있다. 수도권 대학병원 4년차 간호사 최서진씨(28)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파업할 땐 언제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돌아와 일하는 걸 보니 씁쓸하다”며 “(파업 당시) 환자들도 저희(간호사)들도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 마냥 반기긴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 병원에서 유방암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박유리씨(48)도 “전공의도 정책의 피해자라고 볼 수 있겠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밥그릇 싸움으로 비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씨를 7년간 맡아온 주치의는 전공의 문제로 갑자기 사직했다고 한다.
전공의 파업 당시 제기된 근무환경 개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B씨는 “교수들도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지만 시스템의 문제라 과도기적 상황 같다”며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주 72시간 상한제를 지키려면 추가 인력이 필요한데 (전공의) 복귀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다. 이는 전공의 근무 조건뿐 아니라 환자 안전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전공의의 76%가 돌아왔지만 필수의료과 기피 문제 역시 여전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를 보면 수도권 주요 병원의 충원율은 소아청소년과 16.6%, 심장혈관흉부외과 32.8%, 외과 44.7%, 응급의학과 42.5% 등이었다. 대한응급의학회 이경원 공보이사는 “응급진료는 물론 정상적인 수련조차 걱정된다”며 “전공의 복귀를 단순히 정상화로 볼 수 없다. 전문의 수가 유지, 야간·공휴일 수당 지급 같은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jpeg?type=nf190_130)


.pn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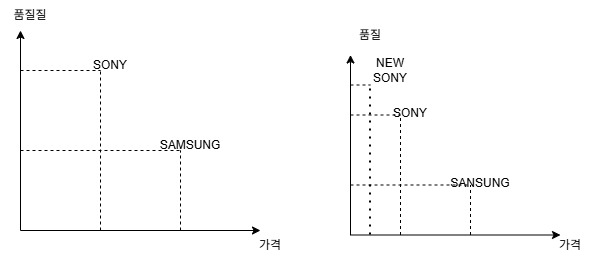.jp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