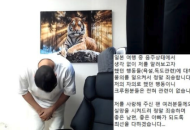내륙해로서 ‘호수’로 지칭해야 한다는 논란도 있어
1989년께 수량 줄면서 북부와 남부 아랄해로 분리
북부 아랄해는 카자흐 노력으로 일부 복원, 어로도
잊혀져 메말라가는 내륙 바다 아랄해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이 옛 소련 시절 대규모 관개사업 등의 영향으로 소멸 중인 아랄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에 주변국들이 동참해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아랄해 연안국은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이지만 아랄해로 유입되는 강의 유역국에는 이 두 국가 외에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등이 포함된다.
20일 키르기스스탄 매체인 타임스오브센트럴아시아(TCA)에 따르면 예르잔 아시크바예프 카자흐스탄 제1외무차관은 지난 15일 자국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환경 문제 토론 행사에서 이같이 제기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앞서 지난 10일 올자스 베크테노프 카자흐스탄 총리는 아스타나에서 개최된 아랄해살리기국제기금(IFAS) 2차 회의에서 아랄해 복원은 모두 힘을 합해야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면적이 6만8000㎢로 한때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호수로 인정받은 아랄해는 1960년대 소련 당국의 대규모 관개사업으로 유입 수량이 줄기 시작했다. 면화와 쌀 등을 재배하고자 지류 아무다리야와 시르다리야 강물을 빼돌려 농경지에 댄 것이다.
이에 따라 1989년께 아랄해는 북부 아랄해와 남부 아랄해로 분리됐다.
이어 2014년께는 남부 아랄해의 동부 유역은 완전히 말라 사막으로 변했다. 이때부터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에 있는 북부 아랄해 살리기에 나섰다.
북부 아랄해 복원 노력은 최근 가시적인 환경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TCA는 전했다.
수위가 오르면서 염도가 낮아지고 일부 토착 어종들이 되돌아왔다. 이에 한때 사라진 어업 활동이 다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카자흐스탄 생태계부에 따르면 북부 아랄해의 연간 어획량은 2000년대 초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고, 그 결과 지역 고용이 되살아나고 식량안보 능력도 개선됐다.
하지만 다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아랄해 복원 노력은 국익 추구 때문에 진전을 못 보는 상황이다.
중앙아 5개국이 1993년 초국경 수자원 공동관리를 위해 출범시킨 IFAS는 다양한 형태의 회원국 국익을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테면 강 상류 지역인 키르기스스탄과 타지키스탄은 수력발전을 위해 수자원을 이용하는 한편 하류지역 국가들은 관개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중앙아 정치전문가인 마라트 시부토프는 소셜미디어에 “현재 카자흐스탄만 자발적으로 아랄해를 살리려 애쓰고 있다”면서 “상류지역에서 물을 방류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해낼 수 없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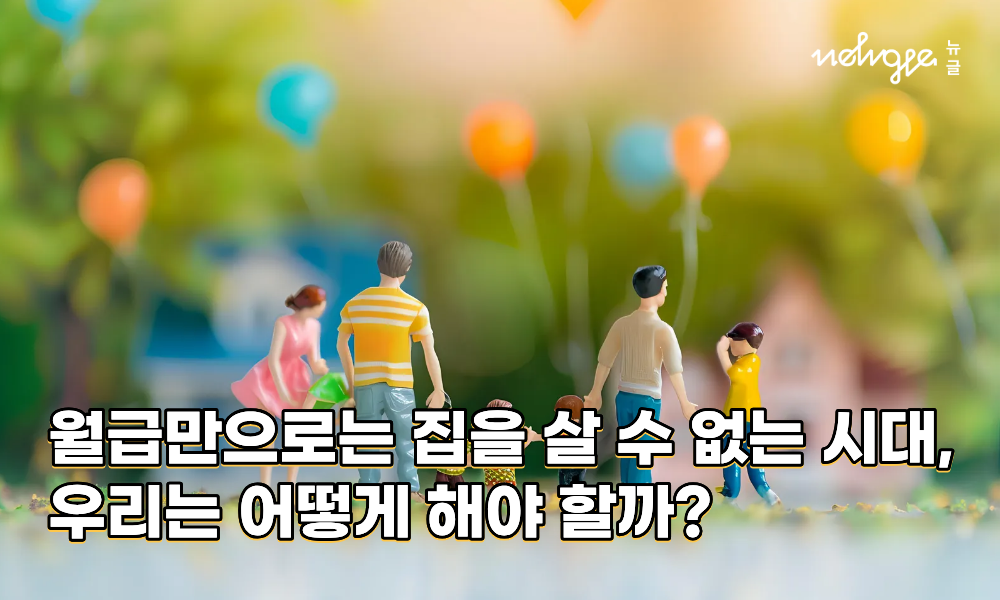-_%EB%B3%B5%EC%82%AC%EB%B3%B8-%EB%B3%B5%EC%82%AC%EB%B3%B8.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