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희(67) 노회찬재단 이사는 기자 출신 저술가다. 1983년 입사한 동아일보에서 약 22년 일한 뒤 2년여 프레시안 편집국장을 지냈다.
그가 2013년 최종현 전 한양대 교수와 공저한 ‘오래된 서울’은 지금껏 9쇄를 찍었다. 서울의 역사·구조와 함께 서촌 지역 인물을 들여다 본 책이다.
2022년 경기 용인시 수지구 머내(동천동과 고기동) 지역 주민들과 협업해 쓴 책 ‘우리 손으로 만든 머내여지도’는 당시 그가 살던 머내라는 지역의 역사와 지리, 인물을 탐사했다. 2016년 그가 제안해 꾸린 ‘머내여지도팀’의 탐사 작업은 3·1 운동을 이끈 지역 인물 15명 발굴과 서훈에 이어 2018년부터 매년 3월29일 전후 수백 명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로 이어졌다.
그의 첫 단독저서 ‘아버지를 찾아서’(2016) 역시 인물과 장소가 중심이다. 출간 당시 호평을 받았던 이 책에서 저자는 교사에서 약사로 전직한 아마추어 사진가인 아버지가 시간·장소 등 설명과 함께 남긴 방대한 사진 필름과 메모를 단서로 통영 등 아버지가 머문 동네와 주변 인물을 깊이 취재해 그의 가족사와 만난 한반도 최근사 100년을 그려냈다.
최근 펴낸 ‘가도 가도 왕십리’(푸른역사) 역시 17세기부터 1980년대까지 서울의 변두리 왕십리 지역에 자취를 남긴 사람들에 대한 정밀한 탐사기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촌 푸른역사 출판사에서 김 이사를 만났다.
“‘오래된 서울’에서 다룬 서촌은 고상한 느낌이 들어 후속편은 아주 다른 성격의 장소를 써보고 싶었죠.”
그는 왕십리를 설명하는 말로 ‘성저십리’가 있다고 했다. 한양도성 밖 10리 이내 지역이라는 뜻이다. “왕십리는 주로 농민 등 하층민이 살았어요. 광대 소리꾼 등 예인도 많이 살았죠. 광대가 필요한 곳이 왕궁이나 사대부들이 많이 사는 도성이잖아요. 부르면 바로 가야 하는데, 도성 안에는 살 여력이 없으니 도성에서 가장 가까운 성문 밖에서 살았죠. 서도소리 전수의 중요한 거점이 왕십리인 것도 그래서죠. 서도소리 명창 이은관 선생도 여기서 살다 돌아가셨어요.”
책에는 그가 구전 등을 통해 확인한 왕십리 지역 특유의 움집 이야기도 나온다. 가을걷이 이후 땅을 파 지하에 약 10평 규모로 만든 공간인데 주로 소리꾼들의 연습장 구실을 했단다.
그는 왕십리를 두고 “도성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탱해주는 곳”이라고도 했다. “왕십리가 주로 농지와 묘지였거든요. 무와 배추 등 신선한 채소류를 재배해 도성 사람의 삶을 지탱해주었죠. 예수 시대에 하층민이 살던 갈릴리 같은 곳이었어요. 사대부가 농사 짓고 묘지를 관리하지는 않잖아요.” 덧붙였다. “서울시립 도축장이 1925년 왕십리에서 멀지 않은 숭인동에 들어섰다가 1961년 왕십리권인 마장동으로 이전합니다. (도축장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던 직업군이었지요.”
왕십리 인물 열전이라고 할 이 책의 주인공은 현대 택견의 개척자 신한승, 만담가 장소팔, 1920년대 막노동자 진서방, 농부 이성문, 창덕궁 무수리 고대수, 똥장수 예덕선생 등 변두리 민중이다.
그는 똥장수 예덕선생 편에서 연암 박지원이 이덕무의 친구 엄행수를 모델로 쓴 ‘예덕선생전’에 기대어 소설 주인공이 서울 장안 여염집의 뒷간을 치워 수거한 똥을 어떤 길로 옮겨, 어느 지역에서 거름으로 사용했는지 여러 문헌과 고지도를 들어 치밀하게 재구성했다.
연암은 소설에서 예덕선생이 치운 똥은 왕십리 무밭 거름으로도 쓴다고 했다. 그렇다면 예덕선생이 이 똥을 직접 무밭까지 날랐을까? 이런 의문이 들었을 때 그는 머리 끝을 쭈뼛 서게 하는 자료를 만났다. 조선총독부가 1921년 제작한 ‘경성도’ 중 광희문 밖 왕십리 지역 지도인데 신당리 공동묘지와 신당리 내지인(일본인) 묘지 사이에 오물류장(분뇨치장)이라는 표시가 선명하다. 그는 이 지도를 토대로 오물류장 터가 예덕선생 같은 똥장수들이 조선 후기에 서울 도성 안에서 수거해 온 똥을 모아 두는 장소였을 것이라고 추론했다.
그가 보기에 왕십리는 시대의 전환을 이끈 근대적 인간형이 나타난 곳이기도 하다. 예덕선생이 그렇다. “예덕선생은 가장 천한 일을 하지만 직업적 열정과 자부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상업적 농업 형성에 큰 기여를 했죠. 그런 점을 연암이 평가한 것이겠죠.”
똥장수 예덕선생·만담가 장소팔
농부 이성문 등 왕십리 인물 열전
서촌 다룬 ‘오래된 서울’ 후속편
“탐구하는 장소의 범위 좁히면
역사나 장소 성격 깊고 풍부해져”
용인 머내 이웃과 동네 역사 책 내고
2018년부터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이 책에서 그가 가장 애착하는 글은 한말에 근대적 호적 제도가 도입된 뒤 스스로 ‘경성’이라는 ‘본관’을 창시한 왕십리 농민 이성문 이야기다. 그는 이 편을 위해 왕십리에서 초교를 나온 고교 동창을 통해 왕십리 토박이 친구들을 수소문해 운좋게 이성문 종손까지 연결되어 “이전까지 없던 새로운 이야기”를 엮을 수 있었단다. 새 본관을 만들어 ‘왕십리 입향조’가 된 이성문이 사실은 대대로 각종 벼슬을 지낸 대단한 문벌가인 평창 이씨 후손이었으며 그의 고조부의 형이 조선 최초로 가톨릭 영세를 받은 이승훈임을 알아낸 것도 이런 취재 덕이었다. 그는 이어 족보 등 여러 문헌을 통해 이성문 고조부 이치훈이 1801년 신유박해 때 형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뒤 연이어 겪은 고초를 밝혔다. 이치훈 후손들 역시 노론의 박해를 피해 서울을 떠나 충청과 강화도 지역을 전전했고 결국 이성문 같이 본관을 바꾼 후손까지 나타났다.
그는 지금껏 서촌과 머내, 왕십리 등 좁은 지역의 역사‧인물 이야기를 써왔다. “(탐구 대상) 장소의 범위를 좁히면 역사나 장소의 성격이 훨씬 깊고 풍부해집니다. 성이 장씨인 만담가 장소팔은 늘 아버지가 장에 소 팔러 갔을 때 내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의 집 바로 옆에 우시장이 있었거든요. 소 팔러 가는 이야기가 만담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유이죠. 장소를 통해 스토리텔링의 맥락을 확인할 수 있죠.”
장소에 대한 관심이 언제부터냐고 하자 그는 기자 시절 이야기를 꺼냈다. “정치부 기자를 주로 하다 지방부 발령이 나서 1992년부터 2년가량 서울 정도 600년 시리즈 기사를 맡아 쓰게 되었어요. 그때 역사적 사실과 지금의 도시 모습을 연결해 기사를 쓴다는 게 정말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실 당시 정치 기사는 하루에도 몇번씩 양김(김대중·김영삼) 머릿속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추론하고 취재해 쓰는 일이었거든요. 당시 조선왕조실록도 처음 봤는데요. 서울이 서울이 된 과정을 그린 태조실록이었어요. 열심히 읽었는데 너무 재밌더군요.”
서울 정도 600년 기사를 쓰면서 익힌 고문헌 탐사 노하우는 이후 옛 자료에 근거한 저술 작업의 든든한 밑천이 되었다.
서울대 철학과 출신인 그는 서울 정도 600년 기사를 쓰면서 기자 생활 중 처음으로 공간을 자각하게 되었다는 말도 했다. 철학자 칸트의 사유를 들어 그는 말을 이었다. “칸트는 인간 인식의 기본 형식을 시간과 공간으로 봤어요. 귀신이나 신과 달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묶여 있다는 거죠. 서울 정도 기사를 쓸 때 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내가 사는 장소를 생각하지 않았나 그런 반성을 하게 되었죠.”
그가 2005년부터 거주한 용인 동네 주민들과 협업한 마을 역사 탐사는 인근 지역에도 자극을 주었다. “머내여지도팀 활동과 머내만세운동 기념행사 이후 이웃 기흥과 처인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마을 역사 기념사업을 하는 것 같더군요.”
왜 머내여지도팀 활동을 생각했냐고 하자 그는 이렇게 받았다. “머내 지역이 수지 중에서도 대표적인 난개발 동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들어와 살면서 원주민 공동체가 깨지는 데 일조했죠. 그런 미안함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길이 마을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옛 동네 모습이 어떤 것인지 기록으로라도 남기자고요. 그 과정에서 원주민들과 대화할 장을 만들자는 게 출발점이었죠. 동네 역사 정리는 원주민들이 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소 팔러 어느 길로 수원 우시장에 다녔는지 알려고 그분들과 하루 종일 걸어 길을 답사하기도 했죠.”
그는 자신이 생각한 문제의식이 문건과 지도에서 확인될 때는 엑스터시(황홀경)를 느낄 정도로 기쁨이 크단다. “살맛이 난다”는 표현도 했다. 언제 기쁨이 가장 컸냐고 하자 그는 머내여지도 작업 때 이야기를 해줬다. “머내에 있는 100m쯤 되는 반달형 뒷골목인 주막거리가 조선 600년 동안 영남 선비들이 서울 올 때 다닌 영남대로의 흔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발견의 기쁨이 컸죠.”
인터뷰를 마무리하며 집필 계획을 묻자 그는 지난 몇년 붙들고 있는 민주화운동가 김병곤 평전이 진도가 잘 안 나가 고민 중이라면서 1세대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박치우 이야기도 꺼냈다.
그의 대학 선배이기도 한 박치우는 박종홍과 쌍벽을 이루는 철학자로 꼽혔지만 한국전쟁 때 빨치산 유격투쟁을 벌이다 사살당한 뒤 잊혀진 학자가 됐다. 그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박치우에 대한 글을 쓰기 위해 지난 몇년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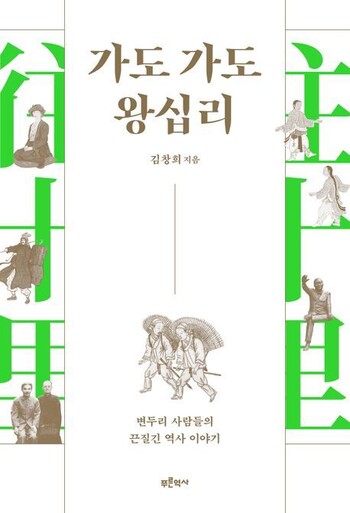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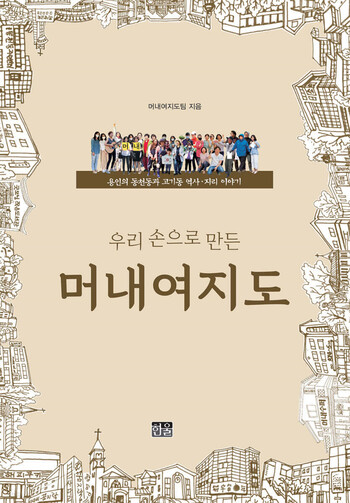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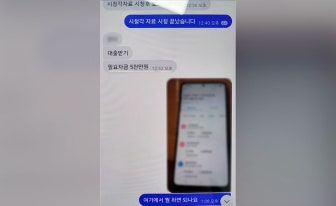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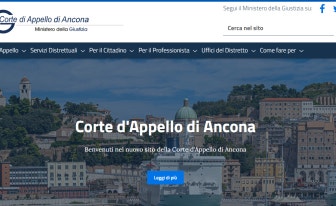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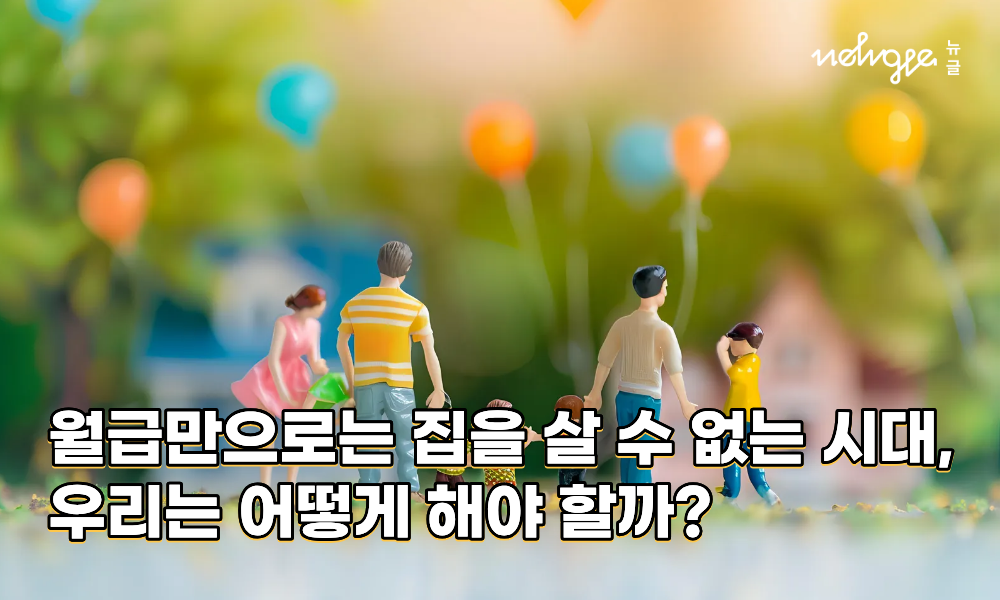-_%EB%B3%B5%EC%82%AC%EB%B3%B8-%EB%B3%B5%EC%82%AC%EB%B3%B8.pn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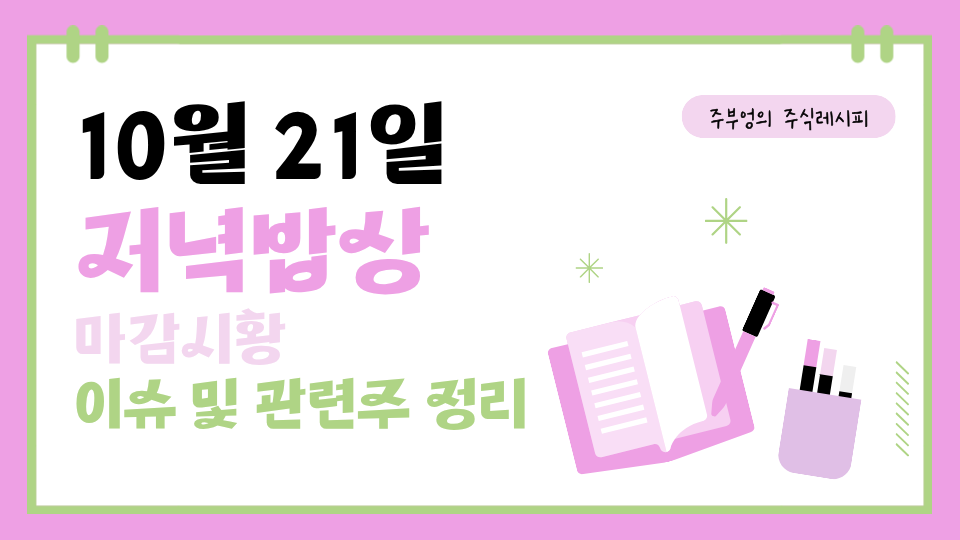.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