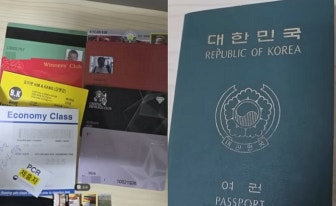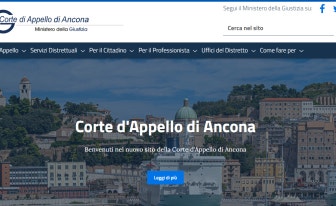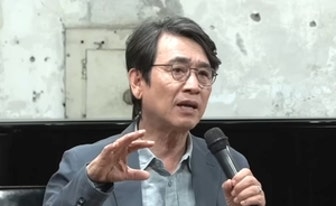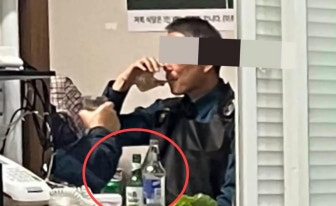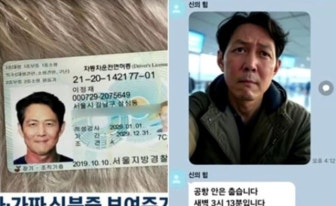오철우 | 한밭대 강사(과학기술학)
1963년 11월, 북대서양 바닷속에서 화산이 폭발했다. 아이슬란드 남서쪽 해안에서 32㎞ 떨어진 해저에서 분출한 용암은 식어 암석이 되고, 분화구에서 뿜어져 나온 화산재가 계속 쌓였다.불과 몇달 만에 지도에 없던 섬이 만들어졌다. 쉬르트세이(쉬르츠에이·Surtsey)라는 이름이 붙은 섬은 돌덩이와 화산재뿐이고 풀도 벌레도 없는 그야말로 새로운 땅이었다.
이곳은 식물학자에게 자연의 실험장이었다. 백지 같은 땅에서 생태계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어떤 식물이 가장 먼저 도착할까? 물결에 실려, 바람에 실려, 아니면 새 먹이가 되어 날아온 씨앗이 새 땅의 식물이 될 것이다.
식물학자들은 지난 60여년 동안 이 보호구역을 해마다 찾아 식생 변화를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 기록이 보여준 실제 상황은 생태학의 기존 이론 모형과 사뭇 달랐다.
최근 학술지 ‘에콜로지 레터스’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섬에 정착한 78종의 관다발 식물 대부분은 기존 이론에서 먼 거리 이동에 유리하다고 분류되던 씨앗 종들이 아니었다. 솜털처럼 가벼운 씨앗도, 새들이 먹기 좋은 과일 씨앗도 아니었다. 분류해 보니 62종은 열매를 맺지 않는 작고 마른 씨앗들이었다. 연구진은 직접 관찰과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들이 바닷새의 소화기관에서 살아남아 배설물로 이곳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했다.
불모지 같던 섬에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1986년 무렵이었다. 오가는 갈매기들이 늘더니 그해 섬 한쪽에 큰 규모로 갈매기 번식지가 형성됐고, 이후 섬은 빠르게 변모했다.
바닷새 배설물은 씨앗만 가져온 게 아니었다. 질소와 인 같은 영양분을 땅에 풍부하게 뿌려주었다. 척박한 땅은 식물이 자라기에 알맞은 터전으로 바뀌었고 새들이 운반한 씨앗들이 뿌리 내릴 조건이 만들어졌다.
연구진은 쉬르트세이섬의 사례가 각별하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섬의 식생 변화는 씨앗들의 이동 특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일어나지 않았음을 직접 보여주었다. 어느 날 생겨난 새들의 서식지가 식생 변화의 결정적 요인이었다. 씨앗 이동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우연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자연이 작동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식물과 새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지만, 사실 쉬르트세이섬은 훨씬 풍부한 생태 관계망을 이루어왔다. 물범도 이곳을 번식지로 삼았고, 물범의 배설물과 생활 흔적은 또 다른 영양분이 되었다. 또한 초기부터 이끼, 지의류, 곤충이 바람과 표류물을 타고 도착했다.
쉬르트세이 생태계는 이론 모형이 다 예측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연하고 복잡하게 전개되었다. 그저 씨앗이 날아온다고 수풀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다. 도착 순서가 아니라 정착 순서가 중요하고, 정착 순서는 씨앗, 새, 물범, 이끼, 곤충, 미생물이 어울리는 관계망에서 결정된다.
한 연구자의 말이 인상적이다. 그는 공간이 주어지면 자연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창의적으로 돌아올 방법을 찾아낸다고 말한다. 생태계도 변하는 기후변화의 시대에, 자신만만하게 우리 예측과 계획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 스스로 창의성을 발휘할 공간을 내어줄 줄도 알아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