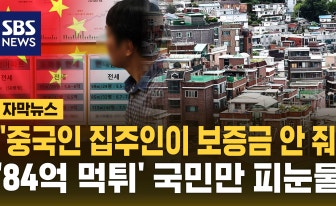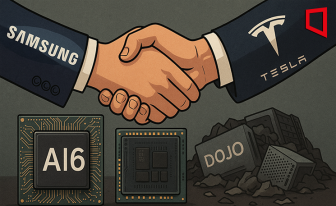프랑스 남서부의 중세 마을 생테밀리옹(Saint-Émilion)은 돌과 포도나무의 고장이다. 석회암 기반의 언덕에 기원전부터 골족이 요새를 세웠고, 중세에는 수도사와 은자들이 바위를 캐내어 암자를 지었다. 수천년에 걸쳐 축성된 석조 첨탑과 성곽, 망루들이 오늘날까지 도시를 지킨다.
마을은 5000여ha(축구장 7000개 넓이) 포도밭에 안겨있다. 행정구역 3분의 2가 와이너리일 정도로 포도원이 드넓다. 기원전부터 와인을 양조한 흔적이 발견되며, 와인 재배의 명맥은 중세 수도원들로 이어졌다. 1999년 생테밀리옹은 포도밭으로는 처음 유구한 역사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올랐다.
내가 여름 휴가로 이 고장을 찾은 지난달은 포도알이 한창 무르익는 때였다. 아직 초록빛인 손톱만한 과실들이 하지 무렵의 햇빛을 쬐고 있었다. 햇발이 더욱 강해지는 7월이면 하루가 다르게 알갱이가 커지고, 9월 수확철이 되기까지 검푸르게 익어갈 터였다.
마을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던 숙소 주변 역시 온통 포도나무의 초록이 넘실댔다. 창문 앞으로 펼쳐지던 샤토 카농(Canon)부터, 보르도에서 가장 비싼 와인을 빚는 샤토 오존(Ausone), 수도원처럼 고풍스런 외관의 샤토 보세주르(Beauséjour)까지. 이름만으로 와인 팬을 설레게 할 포도원이 잇닿아 있었다. 여행자는 샤토 경계를 따라 난 오솔길을 걸으며 이 땅의 풍요로움에 감탄하게 된다.
메를로와 카베르네 프랑의 고장
생테밀리옹 와인을 대표하는 품종은 메를로(merlot)다. 대개 포도원의 절반 이상 면적에 메를로를 심고 20∼40%에 카베르네 프랑을, 10% 안팎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심는다.
이곳을 비롯한 가론강 오른편(우안) 지역은 습기를 좋아하는 메를로에 알맞다. 자갈보다 입자가 곱고 수분을 많이 머금는 점토와 흙으로 덮여있어서다. 토양을 손에 쥐어보면 손바닥에 남는 돌멩이가 거의 없이 흙과 고운 모래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간다. 석회암도 메를로가 좋아하는 기반암이다. 화강암 등에 비해 물러 마치 스폰지처럼 물을 머금기 때문이다.
반면 지롱드강 좌안의 포이약(Pauillac)·페삭-레오냥(Pessac-Léognan) 등은 카베르네 소비뇽 위주로 와인을 빚는다. 여기서는 땅이 거친 자갈과 모래로 덮여 있다. 물이 쉽게 투과되고 땅 속의 열을 보존해, 건조한 환경을 좋아하는 카베르네 소비뇽에 맞다.
메를로 위주의 이런 블렌딩(품종 배합)은 생테밀리옹 와인의 독특한 정체성을 이룬다. 빽빽한 탄닌과 매캐함을 만들어내는 카베르네 소비뇽과 달리 메를로는 숙성 초기부터 붉은색 베리향을 내며 익는다. 짧게 숙성하고 마셔도 향기롭다. 그러면서도 이 지역 메를로는 20년 이상 병 속에서 숙성될 만큼의 잠재력을 지녔다.
다만 이번에 방문한 샤토 트로트 비에유(Trotte Vieille)처럼 토질에 따라 카베르네 프랑의 비중을 메를로만큼 높이는 경우도 있다. 이곳에서는 8ha의 포도원에 메를로와 카베르네 프랑이 49%, 46%씩 심겼다. 생테밀리옹 특유의 ‘흙밭’ 외에도 돌이 많은 밭들을 보유해, 카베르네 프랑을 기르기에도 적합하다고 한다.
카베르네 프랑은 메를로보다 탄닌이 많아 와인에 구조감을 부여한다 . 그러면서도 카베르네 소비뇽 만큼 도수 높은 풀바디 와인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산미 역시 메를로보다 세다. 카베르네 프랑이 섞인 메를로 와인은 메를로 100%에 비해 경쾌한 인상을 준다.
상반된 매력의 두 빈티지
샤토에서는 해에 따라 변주되는 두 품종의 특성을 보여주기 위해 2017 빈티지와 2019 빈티지의 샤토 트로트 비에유를 시음주로 내어줬다.
먼저 시음한 2019 빈티지는 잉크처럼 진한 루비색을 띄었다. 숙성 기간이 아직 6년인 ‘어린’ 와인이지만, 코에서는 벌써 라즈베리, 딸기 같은 붉은 베리향이 짙었다. 이어 커피콩을 가는 고소한 내음과 다크초콜릿·클로브(정향) 같은 비교적 무거운 향들이 올라왔다. 여기에 내가 ‘고목나무’라고 부르는 목재향이 얹히며 향은 중후하게 갈무리됐다.
입에서는 탄닌이 빽빽했다. 포도가 잘 익은 해의 특징이다. 달지 않은 블루베리 주스 가운데 담배 한모금처럼 매운 내음이 변화를 줬다. 향과 맛 하나하나 또렷히 제 목소리를 내는 와인이었다.
반면 2017 빈티지는 한층 서늘하고 신선했다. 자두·블루베리·블랙커런트(카시스)·산딸기 같은 새콤한 과실들의 향연이었다. 여기에 잔을 한번만 스월링(swirling·잔을 돌리는 동작) 해도 철분 내음과 흑연 같은 무기질 향이 굵은 선을 그었다.
입속에선 앞의 빈티지보다 확연히 뚜렷한 산미가 눈을 뜨이게 했다. 달콤짭짤한 서양감초(리코리스)와 허브가 감돌았고, 미네랄은 향보다 맛에서 더욱 증폭됐다. 이 와중에도 검붉은 베리향이 쉴새없이 입안을 즐겁게 해, 와인이 ‘직관적으로 맛있다’는 느낌을 놓지 않게 했다.
정성 깃든 와인엔 모든 해가 ‘그레잇 빈티지’
해마다 다른 기후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 것이다. 2019년엔 포도 생장기인 6, 7월이 무더워 과실미가 응축됐고 9월에도 큰 비가 없어 수확하기에 알맞았다. 열매가 알맞게 숙성되기에 최적이어서 ‘그레잇 빈티지’로 평가된다. 2019년 보르도는 앞뒤 해인 2018·2020년과 함께 역사적인 품질을 뽐낸 ‘트릴로지’(trilogie·3막극)로도 불린다. 트로트 비에유 2019년은 밀도 있는 탄닌과 깊고 고풍스런 향으로 포도가 잘 익은 해의 매력을 구현했다.
2017년은 ‘좋은 해’였지만 와인 전문지들에게는 대체로 2019년보다 약간 낮은 평을 받는다. 포도나무 꽃이 피는 봄에 서리가 내렸고 여름은 서늘한 편이었다. 다만 지구 온난화 이후론 서늘한 해를 기회로 ‘클래식한’ 와인을 빚어내는 실력파 샤토들도 보인다. 무더운 해엔 과실이 선명하고 알콜 함량이 높은 풀바디 와인이 나오는 대신, 흑연·미네랄 같은 보르도 특유의 향은 잦아들기 쉽다. 반면 2017년·2014년처럼 ‘적당히 더운’ 해는 보르도 팬들이 좋아하는 이런 향을 제대로 살릴 수 있다. 내게는 트로트 비에유가 그런 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는 생산자로 기억될 것이다.
샤토를 나서며 문득 궁금해졌다. 이 포도원의 수십년을 지켜봐온 직원들에겐 어느 해가 최고였는지 말이다. 역사적인 빈티지로 꼽힌 2005, 2010, 2016년 등을 예상하고 샤토의 대외협력 담당인 엘레나 응우옌씨에게 물었는데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베스트 빈티지를 고르는 건 자녀 중에 ‘베스트 키드’(best kid)를 고르라는 것과 같아요.”
초봄 이파리가 나고 가을 열매를 거둘 때까지 모든 우여곡절을 기억하는 생산자에겐 매해의 포도가 자식처럼 느껴진다는 뜻이었다. 내가 보르도 와인을 사랑하는 건 이런 정성 때문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먹고 마시기를 사랑하는 이라면 한번 쯤 눈독 들였을 ‘와인’의 세계. 7년 간 1000병 넘는 와인을 연 천호성 기자가 와인의 매력을 풀어낸다. 품종·산지 같은 기초 지식부터 와인을 더욱 맛있게 즐길 비기까지, 매번 한 병의 시음기를 곁들여 소개한다. 독자를 와인 세계에 푹 빠트리는 게 연재의 최종 목표.
한겨레 ‘오늘의 스페셜’에서 더 많은 이야기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네이버, 다음 등 포털뉴스 페이지에서는 하이퍼링크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주소창에 아래 링크를 복사해 붙여넣어 읽을 수 있습니다.)
▶천호성의 천병까기
https://www.hani.co.kr/arti/SERIES/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