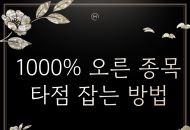‘12·3 내란’ 사태에서 시민들은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만 목격한 게 아니다. 학계와 관료를 비롯한 엘리트 집단의 기회주의적 속성도 적나라하게 확인했다. 특히 ‘민주주의 최후 보루’라 불리는 사법부가 ‘친위 쿠데타’를 수수방관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다. 사법부는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분명한데도 침묵을 지켰다.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는 내란 우두머리를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줬다.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사법부가 왜 이럴까. 군사독재도 아닌 민주주의 정부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정의를 배반한 판사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는 책이다. 민주주의를 표방한 나라들도 얼마든지 법치주의 파괴 행위가 일어난다. 판사가 법치주의 파괴 정권에 동조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판사도 인간이기에 권력의 압도적인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또 판사와 권력자는 계급적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무엇보다 판사는 법의 권위에 복종하는 존재다. 권위주의 정권이 만든 실정법을 무시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다. 판사가 법을 해석(추론)할 때 국가가 제공하는 법적 출처, 즉 ‘법원(法源)’을 완전히 무시하고 법을 집행할 수는 없다. 권력이 확고해지고 억압적 조처가 입법화되면 판사로서는 그 억압적 조처를 권위 있는 법원의 하나로 받아들인다.
판사가 정권의 억압적 조처에 가담하는 건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판사의 부역 행위는 독재 국가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미국 법원은 정부가 관타나모 기지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행위(재판 등 적법 절차 없는 장기간 구금 등)를 허용했다. 한국에서도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과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억압에 동조했던 판사들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에서 나치에 부역한 일부 판사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판사 직무를 수행한 이유로 처벌받은 사람은 단 한명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대부분 법무부에서 정책 수립과 법 집행에 직접 관여한 이들이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를 용인한 판사들도 다 면책특권을 누렸다.
그렇다면 판사들의 부역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책은 판사들의 양심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권위주의 정권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한 판사를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 나치 독일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안락사 프로그램을 거부한 판사나, 노르웨이에서 점령군 나치의 사법 개악에 저항한 대법원 판사들은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다. 판사가 법관의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정의를 배반하지 않고 크게 손해 볼 일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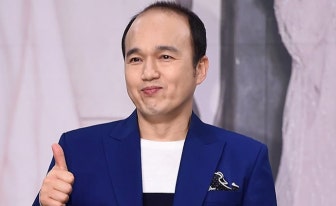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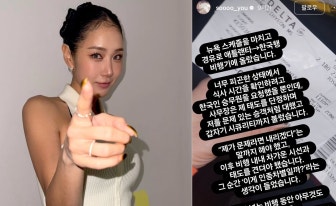




.jp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