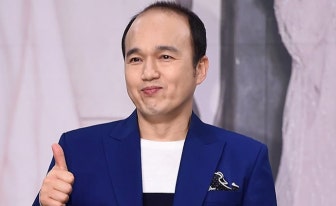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여순 사건’ 77주년을 맞아 비극의 시작인 국방경비대(국군 전신) 14연대 반란에 대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했다. “1948년 10월 14연대 장병 2000여 명이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눌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역사적 사실을 잘못 알고 있거나 외면한 언급이다.
당시 김일성과 남로당은 한국의 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전국에서 파업과 대규모 시위를 지시했고 제주에선 무장 투쟁까지 벌어졌다. 이미 군 내부에도 남로당원이 심각할 정도로 침투해 있었다. 14연대의 남로당원들이 제주 남로당 무장 투쟁 진압 거부를 구실로 ‘인민공화국 수립 만세’ ‘미군 철수’ 등을 내걸고 반란을 일으켜 군경, 민간인을 대거 살해하면서 시작된 것이 여순 반란 사건이다. 반란에 반대한 국군 장병부터 즉결 처형했고 무기고와 탄약고를 털었다. 여수·순천 일대를 돌며 경찰서를 공격하며 지역 유지 등을 살해했다. 유지 딸이라는 이유만으로 10대 소녀를 죽창으로 찔렀다는 기록도 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 잔혹성은 제주 4·3 초기 남로당 폭력을 능가한다. 북한조차 남로당 세력의 초기 잔혹 행위가 반란 실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했을 정도다. 노무현 정부의 진실화해위, 국방부 보고서 모두 여순 사건을 ‘14연대 반란’으로 규정한 것은 당연한 처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신생 대한민국에 총부리를 겨눈 남로당 무장 반란이란 이 사건의 본질을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반란군뿐 아니라 반란 진압 군경에도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해방 직후 혼란했던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다.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고 피해는 보상받아야 한다. 이를 위한 여순 사건 특별법이 2021년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특별법은 반란에 가담해 살인, 방화를 저지른 가해자와 억울한 피해자를 구분하지 않아 반국가 범죄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 대통령은 이 특별법이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아마도 이 대통령은 여순 사건을 계기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비판하고 싶었을 수 있다. 군인들은 부당한 명령을 거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과 남로당의 조직적인 14연대 반란은 차원이 다른 문제다. 누구나 역사를 보는 개인적 시각과 취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은 역사를 사실(史實)에 입각해 평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