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온라인 행정 서비스가 차질을 빚은 지 1일로 6일째가 됐다. 경찰은 1일 화재 당시 작업자 등 4명을 업무상 실화(失火) 혐의로 입건했지만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밝히지 못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폭발 위험이 큰 리튬 배터리를 충분히 방전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철거 작업을 하다 불이 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정보자원관리원은 화재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작업자가 무정전 전원 장치(UPS)의 리튬 배터리 전원을 끈 뒤 40분쯤 지나 배터리에서 불꽃이 튀었다”고 밝혔다. 박용성 한국ESS산업진흥회 고문은 “리튬 배터리는 전원을 차단해도 내부에 전류가 남아 있어 충격을 받으면 언제든 폭발할 수 있다”고 했다.
당시 작업자들은 정전 때 서버에 전기를 공급하는 무정전 전원 장치를 지하로 옮기기 위해 배터리를 철거하고 있었다. 그런데 배터리 업계에 따르면, UPS와 배터리를 옮기는 작업을 할 때는 UPS와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특히 리튬 배터리는 방전 장치를 연결해 전류를 외부로 충분히 흘려보낸 뒤 작업해야 한다. 박철완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배터리 충전율을 50% 이하로만 낮춰도 화재 위험이 거의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이재용 정보자원관리원장은 “직원 면담 결과, 당시 배터리 충전율이 80% 이상이었다”며 배터리 방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배터리 업체 작업 가이드라인에는 배터리를 분리할 때 충전 상태를 30% 이하로 낮추어 작업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보자원관리원이 지난해 소방 점검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재용 원장은 “소방 점검을 하면서 경보 알람이 울려 자칫하면 소화 가스가 터진다든가 하는 우려가 있었다”며 “현장에서 ‘꼭 해야 하느냐’는 말이 나와 (조사에서) 제외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고 했다.
경찰은 화재 발생 전인 지난달 26일 오후 7시 8분쯤 작업자들이 배터리의 전원 차단기를 내린 로그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배터리 전원 차단기도 여러 개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부 배터리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조사해 봐야 한다는 얘기다.
화재 당시 진행 중이던 리튬 배터리 지하 이전 작업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대전 본원 5층 전산실 배터리가 서버 가까이에 있어 화재 시 위험하다고 판단해 지하 1층으로 이전 작업을 한 것이란 게 관리원 측 설명이다. 그러나 박철완 교수는 “지하에 있는 배터리에서 불이 났다면 아예 2~5층 전산실이 통째로 불에 탔을 것”이라며 “지하 이전이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행정안전부가 국가 전산망 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일종의 ‘국가 데이터 총괄 센터’인 정보자원관리원은 2005년 ‘정부통합전산센터’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당시 정보통신부 산하였다가, 2008년 정보통신부가 해체되면서 행안부 산하로 편입됐다. 그러나 전산망 ‘먹통’ 사태 때마다 상위 기관인 행안부는 우왕좌왕했다. 김명수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데이터 센터는 IT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많이 포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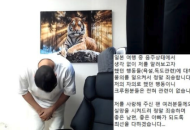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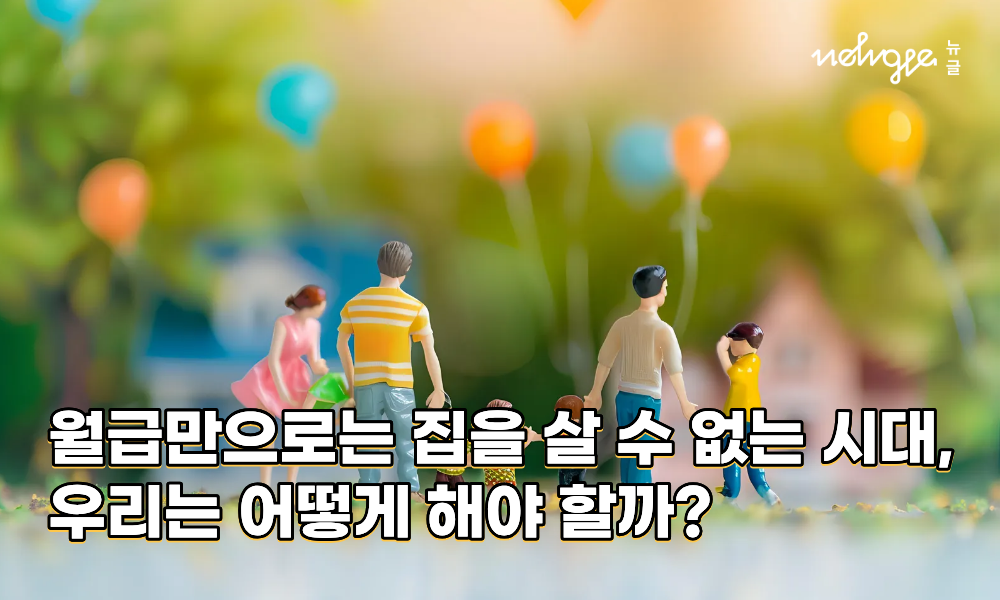-_%EB%B3%B5%EC%82%AC%EB%B3%B8-%EB%B3%B5%EC%82%AC%EB%B3%B8.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