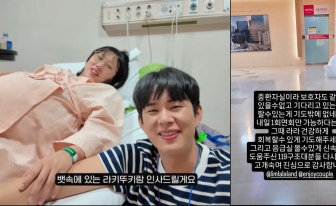평화는 의지나 자존심만으로 지킬 수 없다. 상대를 압도할 군사력으로 억제력을 갖춰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고 전쟁을 막는다. 북한은 120만 명이 넘는 병력에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반면, 국군의 병력은 60만 명에서 올해 45만 명으로 줄었고, 2040년엔 35만 명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예산의 약 70%가 인건비와 유지비여서 미래 전력 확보가 어렵다. 인공지능(AI)이나 무인체계 등 첨단전력 투자는 부족하고, 병력 감소를 메울 수준의 ‘군사혁신’도 요원하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세계 5위 군사력’을 보유했으므로 전작권을 전환해도 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공신력 없는 웹사이트에서 병력·장비의 숫자만을 근거로 단순 계산한 결과일 뿐, 북한의 핵전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허상에 불과하다.
지난 2017년 한미 양국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COTP)’에 합의했다. △국군의 독자 지휘 능력 △동맹의 북핵 대응 능력 △안정된 안보 환경이 충족될 때 전환한다는 원칙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한 상황에서 무리한 전환은 전쟁 억제력 약화로 이어진다. 전작권을 조급히 전환할수록 북한의 오판 가능성도 커진다. 수적 열세를 고려하면, 우리는 미국의 전략자산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항공모함, 핵잠수함, B-2 폭격기, 미사일 경보위성 등 전략무기는 한국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핵심 억제력이고, 감시·지휘통제에서도 아직 미군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미군이 추진 중인 ‘합동 전영역 지휘통제 체계’(JADC2)는 5G 이상급의 초고속 통신망과 AI를 통해 탐지부터 요격까지 수초 안에 처리할 수 있지만, 국군은 20여 년 전 기술인 3G급에 머물러 있다. 이런 격차에서 미 전략자산을 우리가 지휘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평화와 번영을 지켜왔다.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어렵게 하고, 억제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 국군이 독자적 지휘통제 능력과 첨단 정보통신 체계를 완비했을 때 전환해야지, 정치 일정에 맞춰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핵은 핵으로만 억제할 수 있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질적 억제력을 확보하려면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가 현실적 대안이다. 이는 미국의 대한(對韓) 안보공약 강화와 북핵 폐기를 유도할 협상 카드가 될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협력의 문을 연 것은 긍정적이다. 새 총리를 맞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인다면, 한미일 3국 안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발전시키고 아시아판 나토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냉정한 현실에 기반한 ‘확실한 억제’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유지와 한미일 협력의 강화만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와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길이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