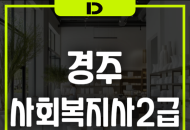민간 중심 디지털 자산 생태계 강조
“금지보다 이해 우선” 신기술 규제 기조 전환 밝혀
AI 확산 속 고용 구조 변화·성장 불균형 우려 지적[워싱턴=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셸 보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는 14일(현지시간) 연준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 계획이 없다고 밝히고, 디지털 자산과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대해서는 “금지보다 이해를 우선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그는 “다른 나라들이 그 길을 택할 수는 있겠지만, 미국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연준은 금융중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대신,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디지털 결제·자산 토큰화 체계를 지향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보먼은 “미국의 접근법은 중앙집중형이 아니라, 민간이 혁신을 이끌고 연준은 인프라와 안정적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이라며 “디지털 자산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레일(rails)’을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 방향도 변화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등장하면 규제기관이 즉각 ‘안돼(No)’라고 반응하곤 했다”며 “이제는 금지보다는 이해를 우선시하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면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보먼은 이를 “‘무조건 금지(No by default)’에서 ‘이해 우선(Understand first)’로의 전환”이라고 표현했다.
연준은 의회가 통과시킨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틀을 구체화하고 있다. 보먼은 “우리는 법이 정한 기한에 맞춰 필요한 감독체계를 구축 중”이라며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혁신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혁신에 대한 접근 방향을 두고 “혁신을 억제하기보다는, 어떤 목적과 구조를 갖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게 허용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디지털 자산 산업에 대한 연준의 태도가 단순한 규제 중심에서 ‘감독+수용’ 기조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풀이된다.
인공지능(AI)과 관련해서도 보먼은 신중한 낙관론을 보였다. 그는 “AI는 금융데이터를 관리하고 분석하는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출심사, 리스크평가, 의사결정 검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먼은 JP모건을 예로 들며 “해당 기관은 연간 기술투자 규모가 150억 달러에 이르고, 이 중 상당 부분이 AI 관련 지출로 추정된다”며 “대형 금융기관뿐 아니라 대부분의 은행이 AI를 전략적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AI 도입이 금융기관의 인력 구조를 바꿀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필요한 인력 규모가 줄어들 수 있고, 이는 노동시장에 일시적 충격을 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생산성과 의사결정의 질이 높아지는 긍정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먼은 또한 AI 투자와 성장세가 일부 대형 기술기업에 집중되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른바 ‘매그니피센트 세븐(Magnificent Seven)’으로 불리는 대형 기술주의 주가가 경제 성장의 상당 부분을 이끌고 있다”며 “AI 관련 산업으로 성장의 무게 중심이 쏠리면, 다른 산업의 침체와 경제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AI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지역경제로 확산돼야 한다”며 “기술 혁신이 전체 금융 생태계의 안정적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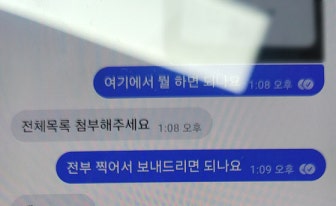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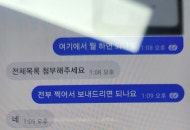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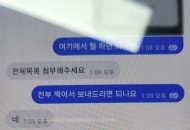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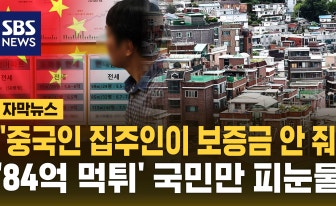

.pn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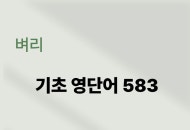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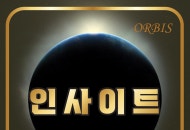
.jp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