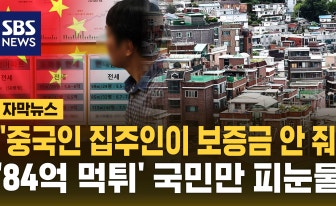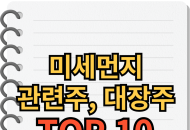| 제주 연안에서 잡힌 청색꽃게.[유튜브 ‘까망형’ 채널 갈무리] |
[헤럴드경제=김광우 기자] “통발만 던져놔도 푸른색 꽃게가 ‘수두룩’”
일반 꽃게와는 다른 선명한 ‘푸른색’ 껍질. 동남아시아 쪽 아열대 바다에서 주로 볼 수 있는 ‘청색꽃게(타이완꽃게)’다.
놀라운 점은 이같은 청색꽃게가 최근 우리나라 제주도 부근에서 발견되고 있다는 것.
심지어 드문드문 발견되는 수준도 아니다. 제주 일부 지역에서는 누구나 쉽게 청색꽃게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개체 수가 늘어나고 있다.
| 제주 연안에서 잡힌 청색꽃게.[X(구 트위터) 갈무리] |
청색꽃게는 색깔과는 별개로 식용이 가능하다. 맛도 우리나라 꽃게와 크게 다르지 않아, 새로운 개체의 등장을 반기는 목소리도 있다.
다만 생태계 변화에 대한 우려는 그칠 수 없다. 청색꽃게의 등장은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온도 상승이 빠르게 이뤄졌다는 증거다.
심지어 청색꽃게의 토착화가 기존 생태계의 먹이사슬 등에 미칠 악영향도 쉽사리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제주 연안에서 발견된 청색꽃게.[X(구 트위터) 갈무리] |
최근 제주에서 발견되고 있는 ‘청색꽃게’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양, 남태평양 등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종이다. 우리나라 남해안 일부 지역에서 발견된 사례가 있기는 하지만, 제주에서 발견된 건 극히 드문 사례다.
제주에서 청색꽃게를 봤다는 목격담은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올해 유독 개체 출현이 잦아지며, SNS 등을 중심으로 목격담이 퍼지고 있다. 낚시꾼들 사이에서도 청색꽃게가 주로 출현하는 지역 정보가 공유되고 있다.
| 제주 연안에서 발견된 청색꽃게를 요리한 모습.[유튜브 채널 ‘제주마씸TV’ 갈무리] |
청색꽃게는 우리나라 꽃게와 비교해 맛과 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인도 등 주 생산국에서는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향후 출몰 정도에 따라 상품화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약 3년 전부터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30) 씨는 “이번 여름에 동네 주민들한테 얘기를 듣고 인근 바다를 찾았는데, 통발에 처음 보는 게가 잔뜩 잡혀 있어 놀랐다”며 “맛도 기존 꽃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 제주 연안에서 발견된 청색꽃게.[인스타그램 갈무리] |
다만 청색꽃게의 출현을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갑작스러운 개체 수 증가의 원인이 ‘수온 상승’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 아열대 지방에 서식하는 청색꽃게가 정착할 정도로, 제주 바다에 뜨거워졌다는 얘기다.
국립수산과학원이 발표한 ‘기후변화 영향 브리핑 북’에 따르면 지난 1968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57년간 한국 해역의 연평균 표층 수온은 1.58도 상승했다. 전 지구의 표층 수온이 0.74도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수준이다.
| 제주시 조천읍 함덕해수욕장에서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즐기고 있다.[연합] |
제주 바다도 이같은 영향을 피할 수 없다. 제주지역의 고수온 발생일수(주의보~해제)는 2020년 22일에서 2021년 35일, 2022년 62일, 2023년 55일, 2024년 71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는 85일간 고수온 특보 기간이 유지되며,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같이 극단적인 수온 상승이 지속될 경우, 해양 생태계 또한 변화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제주 지역의 변화는 ‘청색꽃게’에 그치지 않고 있다. 일부 아열대 혹은 열대성 어종의 관측 사례가 점차 늘어나는 상황이다.
| 제주 연안에서 발견이 늘어나고 있는 파랑돔.[국립생물자원관 제공] |
국립수산연구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자망과 통발을 이용해 어확시험을 진행한 결과, 총 177종 2만5446개체가 어획된 가운데 아열대 어류가 74종 1만255개체로 전체 4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에는 아열대 어종 출현율이 47%로 가장 높았다.
반면 기존 제주도 수산업을 지탱하는 주요 어종의 출현은 줄고 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연간 20만톤 수준으로 잡히던 살오징어의 경우 지난 2023년 기준 2만3000톤으로 어획량이 급감했다. 갈치·고등어 등 주요 어종의 경우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전남 여수 가막만 한 가두리양식장에서 작업자들이 방류할 치어를 바구니에 담아 무게를 재고 있다.[연합] |
이에 따라 지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평균기온이 1도 증가할 경우, 산업 생산량은 약 3.1%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여기에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2040년 제주 지역 산업생산액은 최근 50년간 약 4.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 특산 수산생물이 북상하고 아열대성 어류의 비중이 높아진 데 따라, 식용이 가능한 아열대성 어류를 탐색해야 한다”며 “향후 우리나라 국민과 제주도민이 식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식연구 추진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