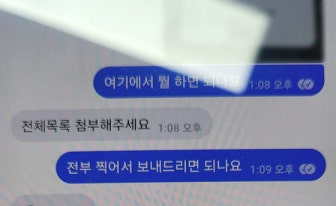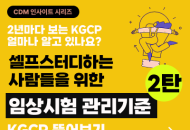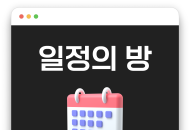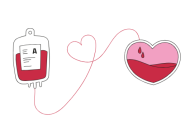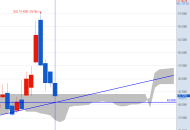혜성처럼 등장해 90년대 브릿팝을 정의한 뮤지션…라디오헤드·블러 등과 전성기
2009년 해체 이후 16년 만에 전 세계 투어…21일 일산 고양종합운동장서 내한공연
| 오아시스는 과거를 장식한 밴드가 아닌 지금 순간에 살아있는 뮤지션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재결합 공연 소식에 그토록 가슴이 뛰는 이유다. [오아시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
[헤럴드경제=김주리 기자] 영국 브릿팝을 대표하는 밴드 오아시스(Oasis)의 리암 갤러거(보컬)는 이들의 해체 이전 발매된 ‘록 더 박스’(Lock The Box)에 담긴 인터뷰에서 이 같은 말을 한 적이 있다. ‘오아시스의 전성기는 이미 지났고, 돈 때문에 투어를 하는 것’이니 ‘콘서트 와서 빌어먹을 티셔츠(goods·굿즈/콘서트 기념 상품)나 구입하고 꺼지라’고.
그래. 당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던 록 밴드의 과격하고 솔직한 발언에 대한 적절성은 차치하더라도, 그의 말은 어느 정도 사실일 수 있다. 오아시스를 대표하는 곡이 거의 대다수 포진된 1994년 데뷔 앨범과 다음해 발매된 두 번째 앨범 ‘(왓츠 더 스토리) 모닝 글로리?’(What’s The Story, Morning Glory?)의 곡들이 가진 혁신성과 천재성, 대중음악 경지에 다다른 듯한 수준 높은 완성도를 생각하면 이후 나온 이들의 곡은 다소 진부하고 심심하다. ‘선데이 모닝 콜’(Sunday Morning Call)이나 ‘한 걸음씩’(Little by Little)은 아무리 들어도 ‘캐스트 노 쉐도우’(Cast No Shadow)의 세련된 서정성을 따라가지 못하고, ‘라일라’(Lyla)는 도무지 ‘원더월’(Wonderwall)의 영국적 멋스러움을 표현해내지 못한다.
다만 여기에는 한 가지 질문이 남는다.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전성기’를 규정하는 걸까?
혁신의 순간만을 전성기로 부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예술가는 데뷔 초반에 생을 끝낸 것이나 다름없다. 어떤 이들은 전성기를 ‘가장 빛났던 한 시절’로 정의하지만, 음악은 때로 시간을 거부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리브 포에버’(Live Forever)에 열광하며 ‘왓에버’(Whatever)에 자신을 투영하고, ‘돈 룩 백 인 앵거’(Don’t Look Back in Anger)를 들으며 눈시울을 적신다. 스포트라이트가 사라진 뒤에도 현재의 감정을 흔들고 인간의 삶을 움직인다면 그것은 과거가 아닌 현재형이다. 즉 전성기는, 순간이 아닌 영속성으로 존재한다.
오아시스는 과거를 장식한 밴드가 아닌 지금 순간에 살아있는 뮤지션이다. 이것이 우리가 그들의 재결합 공연 소식에 그토록 가슴이 뛰는 이유다.
Whatever I choose and I’ll sing the blues if I want
I’m free to say whatever I
Whatever I like, if it’s wrong or right, it’s alright”
(나는 내가 무엇이 될 지 결정할 자유가 있어
무엇을 결정하든, 내가 원하면 블루스를 부를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말을 할 자유가 있어
무엇이든 간에 말이야, 옳든 그르든, 괜찮아)
- 오아시스, ‘왓에버’ 中 -
| 기술의 정교함이나 공학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닌,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기타)의 미세한 손가락의 터치, 감각에 새겨진 기억 ‘지금’이라는 감정이 결합했을 때만 가능한 유일한 소리다. 동일한 장비와 동일한 악보를 쓴다 해도 복제할 수 없다. 재현이 아닌, 어찌 보면 그의 직관과 혼(魂)에 각인된 존재적인 표출에 가깝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NurPhoto] |
“이걸 인간이 만들었다고?…네,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기술이 따라올 수 없는 손 끝의 ‘감각’
말로 설명되는 것이 아닌 소리로 증명된다. 오아시스의 음악이 그토록 선명하게 각인되는 이유는 인간만이 낼 수 있는 결, 인간만이 선택할 수 있는 질감, 인간만이 직감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이다.
대표적 순간이 ‘슈퍼소닉’(Supersonic) 코러스 구간에 등장하는 기타 리프다. 이 리프는 기술의 정교함이나 공학적 계산으로 만들어진 소리가 아닌, 노엘 갤러거(Noel Gallagher·기타)의 미세한 손가락의 터치, 감각에 새겨진 기억, ‘지금’이라는 감정이 결합했을 때만 표현될 수 있는 소리다. 동일한 장비와 동일한 악보를 쓴다 해도 복제할 수 없다. 재현이 아닌, 어찌 보면 그의 직관과 혼(魂)에 각인된 존재적인 표출에 가깝기 때문이다.
오아시스의 또 다른 음악적 특징 중 하나는 ‘날 것’인데, 다듬지 않은 감정선의 소리는 때때로 거칠고, 투박하고, 균열되어 있지만 바로 그 균열이 음악을 호흡하게 만든다. 적절한 구간에 볼륨을 높였다 줄였다, 때로는 뒤틀기까지 하는 사운드와 코드의 반복 속에서도 듣는 이들은 그들의 생기(生氣)를 고스란히 느낀다.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기계가 만든 매끈하고 정갈한 톤에는 없는 체온, 그리고 연주자의 감정과 감각이 실린 진동. 오아시스의 음악은 음악 그 이상의 감각 재현이다.
그렇기에 이들의 음악은 기술로 온전히 이해하기 어렵고 수치로 분석할 수 없다. 오아시스의 사운드는 악보 바깥에서 발생하는 감정의 파동이며 음악이 인간의 예술임을 증명하는 가장 육체적인 방식이다. 소리의 꾸밈이 아닌 존재의 발화, 이것은 인간만이 만들 수 있는 창조인 동시에 우리가 여전히 오아시스에 열광하는 이유다.
Go and tell it to the man who cannot shine
Some might say we will find a brighter day
Some might say we will find a brighter day”
(어떤 이들은 천둥과 번개가 지나면 햇빛이 모습을 나타낸다고 하지
빛을 잃은 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줘
어떤 이들은 또 말하곤 해, 우리는 더욱 밝은 날들을 마주할 거라고
그래, 그들은 말하곤 하지, 우리는 더욱 밝은 날들을 마주할 거라고)
- 오아시스, ‘누군가 말했다’(Some Might Say) 中 -
| 오아시스는 자신들의 삶을 ‘비극의 서사’가 아닌 ‘존재의 선언’으로 다시 쓴다. 이것이 오아시스가 가진 강력한 힘이다. “나는 여기 있다.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메세지가 시대를 건너 누구에게든 닿는 이유는, 그 태도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살고 싶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게티이미지/Photo by Mike Klarke] |
“그래, 불행이 닥쳤어…그래서 어쩔 건데? 20년에 한 번 일어난 일이잖아”
오아시스의 음악에 현실을 외면한 낙관은 없다. 그들의 지나칠 정도의 긍정적이고 당당하고 담담한 태도는 상처의 반대편에서 나온다. 노엘 갤러거는 어린 시절,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에게 ‘죽기 직전까지 맞곤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리고 또 말한다. “단 한 번도 스스로를 동정한 적 없다”고. 삶이 무너질 때, 주먹을 불끈 쥐고 ‘그래도 난 살아간다’는 태도. 오아시스의 음악은 바로 이 삶을 향한 태도의 기록이다. 그들의 긍정은 가볍지 않고, 선언은 공허하지 않다.
이같은 태도는 이들 곡의 메세지에 그대로 새겨져 있다. ‘리브 포에버’, ‘한 걸음씩’, ‘돈 룩 백 인 앵거’를 통해 오아시스가 반복해서 표현하는 건 위로도 믿음도 희망도 아닌 확신이다. 삶이 무너질 때 “괜찮아질 거야”라고 말하는 서글픈 낙관이 아닌, “나는 무조건 일어난다”라고 말하는 자들의 음악. 이 태도는 비관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닌, 역으로 불행을 또렷하게 응시하며 그 불행에 매몰되지 않고 시선을 떼어내지 않는 힘에 가깝다. 그렇기에 오아시스의 음악은 듣는 이의 자존감까지 닿아버린다. 그들의 음악은 감상용 감정과 위로가 아닌, 삶을 밀어붙이는 연료다.
이 같은 태도는 오만에 가까울 만큼 단호하고, 때로는 거칠기까지 하다. 그리고 그 거침 속에는 자신에게 굴복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의지가 있다. 불행을 예술적으로 소비하지 않고, 절망을 자기 서사의 장식으로 쓰지 않는다. 오아시스는 자신들의 삶을 ‘비극의 서사’가 아닌 ‘존재의 선언’으로 다시 쓴다. 이것이 오아시스가 가진 강력한 힘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나는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메세지가 시대를 건너 누구에게든 닿는 이유는, 그 태도가 사람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 ‘살고 싶다’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결국 오아시스의 긍정은 관념이 아닌 존재의 긍정이다. 넘어져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톤, 바닥에 닿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통의 체온, 다시 일어서 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목소리. 그렇기에 그들의 선언은 현재형이기도 하다. 세상이 아무리 냉소적으로 변한다 한들 인간이 절망 앞에서 다시 한 번 이를 악물어야 하는 순간이 계속되는 한 오아시스의 선언은 유효하다. 비관을 뚫고 나온 한 줄기의 긍정. 그것이 오아시스가 남긴 태도의 미학이다.
A better place to play?”
(알고 있잖아, 네가 훨씬 더 나은 순간을 찾을 거란 걸”
- 오아시스, ‘돈 룩 백 인 앵거’ 中 -
| 오아시스는 희망을 말할 때조차 눈물을 내세우지 않는다. 때로는 비웃듯이, 때로는 세상 위에 올라선 듯, 감정이 아닌 신념으로 사랑하고, 부드러움이 아닌 단단함을 내세우며 위로가 아닌 자존을 택한다. 그렇깅에 그들의 음악은 유치하거나 신파적이지 않고 감상에 빠지지 않으며, 결국 삶의 태도를 스타일로 연마한 미학이 된다. [오아시스 공식 인스타그램 캡처] |
오만 속에 피어난 영국식 로맨티시즘…신념으로 사랑하고, 확신으로 노래한다
오아시스의 음악에는 비웃음, 허세, 오만과 자기확신이 묵직한 돌덩이처럼 박혀 있다. 그러나 그 오만은 타인을 짓밟고 굴복시키기 위한 폭력이 아닌, 삶을 관통한 이들이 스스로를 살아내기 위한 일종의 신념에 가깝다. 영국식 냉소와 허세는 현실 부정이 아닌 ‘나는 쓰러지지 않는다’는 선언이며 그 형식 자체는 때로 로맨티시즘으로까지 느껴진다. 영국 특유의 심드렁한 유머와 비틀린 자존, 무심한 말투 속에는 숨어 있는 건 다름 아닌 ‘끓어 오르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의 로맨티시즘은 감성적이지 않다. 오아시스는 희망을 말할 때조차 눈물을 내세우지 않는다. 때로는 비웃듯이, 때로는 세상 위에 올라선 듯, 감정이 아닌 신념으로 사랑하고, 부드러움이 아닌 단단함을 내세우며 위로가 아닌 자존을 택한다. 그렇기에 그들의 음악은 유치하거나 신파적이지 않고 감상에 빠지지 않으며, 결국 삶의 태도를 스타일로 연마한 미학이 된다.
뼈에 새겨진 듯한 오만이 끝내 로맨틱한 이유는, 타인을 향한 과시가 아닌 자신에게 거는 약속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오아시스가 시대와 국경을 넘어 현재까지 사랑받고 추앙받는 이유이자, 수많은 브릿팝 밴드 중 ‘신화’로 남은 이유다.
오만을 껍질로 두르고 로맨티시즘을 심장에 넣은 뮤지션. 오아시스는 이 아이러니한 모순 자체로 이들 존재의 서사를 완성했다.
(우리는 영원할 거야)
- 오아시스, ‘리브 포에버’ 中 -
오아시스는 전성기가 지난 과거형 밴드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듣는 이의 삶을 흔드는 현재형 목소리를 가진 뮤지션이다. 그들은 오래 전에 말했다. “우린 이미 예전에 끝났다”고. 하지만 세상은 아직 그들을 끝내지 않았다. 아니, 끝낼 수 없다. 인간이 절망을 겪는 한, 다시 일어서야 하는 순간이 반복되는 한, 오아시스의 노래는 언제나 현재형으로 다시 소환될 것이다. 전성기는 순간이 아닌 영속성으로 존재한다.
오아시스의 내한공연은 21일 열린다. 세월은 흘렀고, 세상도 변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문장이 있다. “우리는 영원할 거야”(You and I are gonna live forever).
영원은 젊음의 환상이 아니라, 우리가 그 노래를 다시 재생하는 순간 새로 태어나는 현재형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가자, 티셔츠 사러.
그리고 영원을 노래하러(Live Fore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