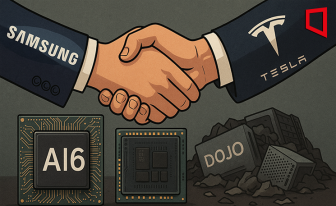최근 5년간 1만3410개 중 22.5% '부족'
30년째 바뀌지 않는 제도에 '용량 부족' 꼼수도
신종 소비재는 실태조사서 제외
산업통상자원부가 운영 중인 '정량표시제도' 대상 생활필수품의 5분의 1이 실제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 허용오차를 피하면서도 실량을 교묘히 줄인 제품이 다수인 것으로 조사돼, 형식적 규제를 넘는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2일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량표시상품 내용량 조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조사한 제품 1만3410개 가운데 3018개(22.5%)가 표시량보다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법적 기준은 충족했으나 제품에 표시된 정량보다 실제로 들어 있는 양이 부족한 '적합 과소실량' 제품은 2827개(21.1%)였다. 품목별로는 액화석유가스(47.4%), 꿀(37.5%), 도료(37.1%), 윤활유(30%) 등의 과소실량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곡류(28.9%), 차·커피·초콜릿류 및 코코아(27.5%), 우유(26.7%)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부는 1991년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계량법)에 근거해 우유·라면·화장지 등 생활필수품 27가지 품목에 대해 정량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계량법에 따르면 상품의 용기(포장)에 정량을 '표시'해야 한다. 실제 내용량이 표시된 정량 대비 '허용오차'를 초과해선 안된다. '오차범위' 내에서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꼼수를 이용해 생산비용을 줄이는 생필품 제조업체가 적지 않다는 게 김 의원의 분석이다.
더 큰 문제는 '평균량 규제'가 없다는 점이다.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는 상품의 평균 실량이 표시량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는 이른바 '평균량 요건'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은 이미 이 규정을 도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하지 않아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정량표시 대상도 곡류, 과자류 등 27종에 국한돼 반려동물용품, 건강기능식품 등 신종 소비재는 제외돼 있다. 또한 시판품 조사를 맡고 있는 계량협회는 법적 조사 의무만 있을 뿐, 제도 전반을 총괄하는 전담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서민 가계와 직결되는 체감 물가의 문제이자 소비자 신뢰의 기반"이라며 "생필품을 교묘히 덜 담는 행위는 사실상 편법 인상 효과를 내는 만큼,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시판품 조사 예산 확대 및 전담기관 지정 등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