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국내 태양광 기업 국내판매는 35% 줄어들어
모듈 기업 문닫고, 인버터 시장 90%는 중국산
이대로 태양광 비중 늘리면 국내 에너지 안보 문제될수도
정부가 태양광 지원 예산을 40% 이상 늘리는 등 보급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국내 태양광 산업은 빠른 속도로 붕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모듈·인버터 시장을 중국산이 점령하면서 국가 예산으로 중국산 기업을 지원하는 꼴이 되는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태양광 발전은 늘지만 산업생태계는 없는 '빈껍데기 시장'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세계적으로 중국산 태양광 설비의 안보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이대로면 국내 에너지 안보도 흔들릴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16일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태양광 기업(모듈·인버터·소재 등)의 내수매출(국내 판매액)은 2019년 2조3197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2023년 1조8690억원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전체 매출합이 1조5000억원에도 미치지 못해 2019년 대비 35% 이상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태양광 발전 보급량은 같은 기간 2.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2019년 국내 태양광 총 보급량 1만2745GWh인데, 2023년 2만8033GWh을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3만GWh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앞으로다. 정부는 올해 5944억원이던 신재생에너지 보급 예산을 내년도 8480억원으로 늘렸다. 약 42% 늘어난 수치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신설했다. 예산 증가는 이러한 기조가 반영된 결과다.
하지만 이대로면 이 과정에서 중국산 태양광 모듈과 인버터가 전국에 빠르게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다. 국내산 태양광 산업을 장려하고 중국산을 막을 장치가 사실상 없고, 생산원가 차이로 태양광 관련 모든 벨류체인이 무너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국내 거의 유일한 태양광 모듈 생산기업인 한화솔루션은 이미 사업 타깃을 미국으로 바꿨다. 미국 현지에 생산공장을 짓고 있고, 국내 생산 셀의 대부분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국내 판매 수치가 감당이 안돼 이미 국내 공장 2곳중 1곳은 문을 닫았다.
태양광 모듈로 생산한 에너지의 전압을 바꿔주고 전기를 배분하는 '두뇌' 역할의 인버터는 상황이 특히 심각하다. 국내 유통되는 인버터의 80~90%는 중국산이다. 국내에서 직접 인버터를 생산하는 기업은 몇개 남지 않았다. 특히 태양광 인버터를 판매하는 국내 대기업들도 중국 현지에서 유통되는 인버터를 단순 조립하거나 상표만 바꿔 자사 브랜드를 달고 판매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실이 직접 업계 조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120~125kW급 중국기업의 인버터의 경우 자국에서 480만~550만원대에 유통된다. 이를 국산 제품으로 포장한 일종의 ‘택갈이 제품’은 550만~600만원선으로 약 10%의 마진이 붙어 국내에서 거래된다. 국내 기업들은 이 차익을 위해 사실상 중국산 인버터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업 대부분은 과거에 국내 공장을 짓고 직접 사업을 해왔지만, 중국산 제품과의 가격차이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중국산 유통 모델로 사업을 바꿨다.
택갈이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장악했음에도 정부는 중국산 인버터 점유율·수입과 관련해 현황 파악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구 의원의 현황파악 제출 요구에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정부가 ‘보급률 확대’ 뿐 아니라 국내 산업 생태계 부활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보급 속도만 강조하면 시장은 저렴한 중국산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또 당장 중국산으로 국내 태양광 발전 시장을 채운다면 향후 에너지 안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실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산 인버터 등에서 사전 공지돼지 않은 프로그램 등이 발견되면서 '킬스위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 관련 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의혹이다.
업계에서는 10년후 애프터서비스(AS)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유지·보수·관리 등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중국 기업이 외면한다하더라도 중국 현지에 있는 기업에게 강제할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현재 전체 에너지원 중 태양광 비중은 5% 남짓인데, 이 수치가 정부 목표대로 30%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유지보수 문제가 생긴다면 향후 전력 공급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계에서는 국산 부품 사용 비중을 의무화하거나, 기술개발·설비투자 지원으로 밸류체인을 복원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정부의 태양광 지원의 수혜를 중국이 입는다면 정책적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 이라며 “무리한 보급 확대보다는 국내 산업과 함께 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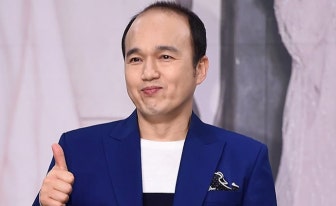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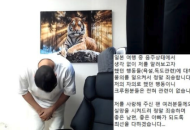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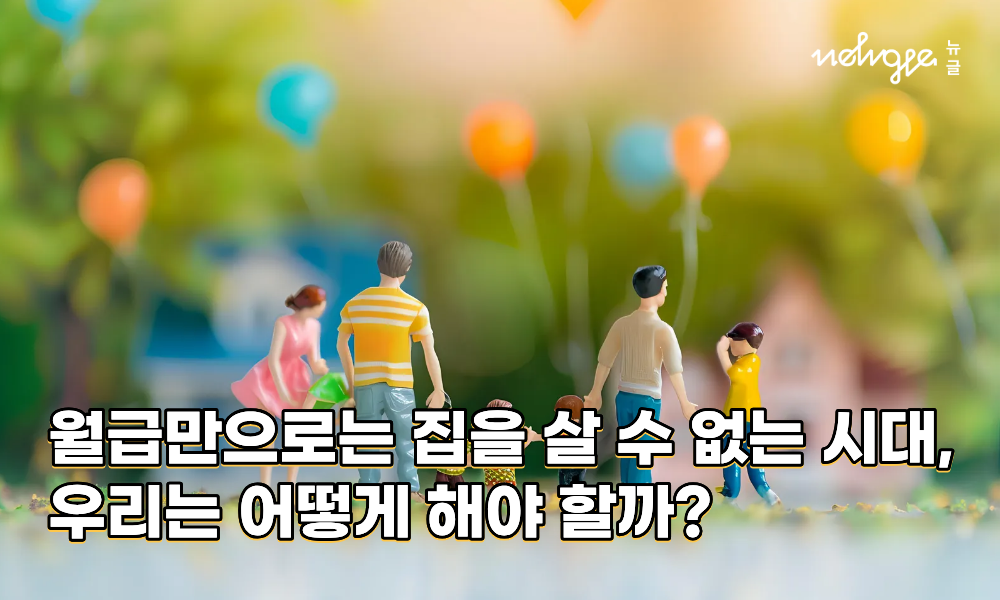-_%EB%B3%B5%EC%82%AC%EB%B3%B8-%EB%B3%B5%EC%82%AC%EB%B3%B8.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