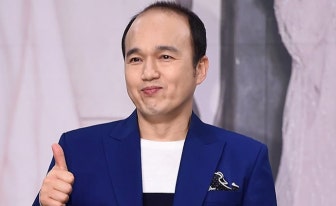대통령 한마디에 뒷북 대응
김다빈 사회부 기자
지난 6~7월엔 두 차례에 걸친 현지 르포 취재도 감행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중국계 갱단의 보복을 피해 숨어 사는 한인 실태를 확인한 뒤 고발했다. 당시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한 20대 청년은 “귀국해 한국 경찰을 만나겠다”며 기자와 함께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을 찾았다. 그럼에도 “지금은 귀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우리 정부가 캄보디아 측이 반대급부로 요구하는 반정부 인사 인도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겨냥한 취업 사기와 납치·감금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23년 20건이던 캄보디아 납치 신고 건수는 지난해 221건으로 급증했다. 유엔마약범죄사무소와 국제앰네스티도 캄보디아 내 대규모 범죄조직이 다국적 인력을 감금해 사기 범행에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교부는 11일에서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첫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본지의 최초 보도 이후 333일 만이다.
앞서 당일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건에 총력 대응하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또 다른 피해자인 대학생 박모씨(22)가 8월 고문 끝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진 뒤 이달 9~10일 정치권에서 질타가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화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외교부는 피해자 탓을 잊지 않았다. 외교부는 입장문에서 “온라인 스캠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가담하는 사례가 많다. 이들은 잠재적 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지적했다. 마치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다.
과연 그럴까. 이들 범죄조직은 ‘번역 아르바이트’ ‘서류 배달’ 등 교묘하고 진화된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넘긴다.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책망하지만 누구도 이들이 잘못했다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것과 다르지 않다.
외교부가 언론 경고와 피해자 호소를 외면하는 사이 대학생이 사망하는 비극이 발생했다. 부랴부랴 코리안데스크 설치 추진 등 대책이 마련됐지만 이 역시 외교부가 캄보디아 측 협력을 이끌어내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다. “국민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정부 당국자 말이 허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