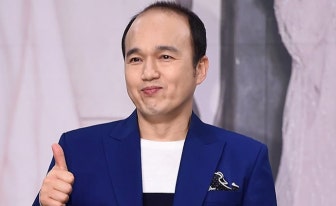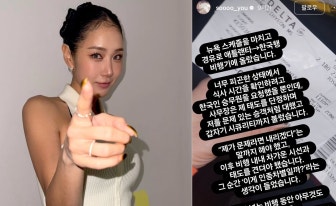새 시대 맞춰 기존 제도 손질해
수십兆 공장 건립 재원 마련
李 "독점폐해 막을 장치도 필요"
당정 협의·사회적 합의 거쳐야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접견한 자리에서 인공지능(AI)산업에 한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AI 등 국가 전략산업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 검토를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픈AI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월 90만 장(웨이퍼 투입량 기준)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구매하는 공급 의향서(LOI)를 맺었다. 김 실장은 “이는 두 회사가 현재 생산하는 물량과 버금가는 규모인 만큼 공장을 두 배가량 새로 지어야 할 것”이라며 “두 회사가 많은 이익을 내고 있지만, (앞으로 공장을 지으려면) 천문학적인 투자 재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은 연간 수십조원의 자금을 들여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다. 설비투자비(CAPEX)는 일반적으로 보유한 현금을 쓰거나 회사채, 대출 등으로 조달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기업이 운용사(GP)로 펀드를 조성해 투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게 된다. 금융사도 비(非)금융 산업인 반도체 등에 돈을 공급하기 쉬워진다. 이에 따라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해져 투자를 촉진하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 자본시장법 등 규제를 바꾸면 삼성전자나 SK그룹이 운용사(GP)로 펀드를 조성할 수 있다”며 “국내 금융사를 포함해 블랙록, 블랙스톤 등 글로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자금으로 기업들이 지방에 공장을 지으면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지방 균형 발전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업들은 아낀 투자 재원을 연구개발(R&D) 등에도 쓸 수도 있다”고 말했다.
1982년 도입된 금산분리 제도는 산업 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은산분리, 금융회사가 기업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금산분리 등 두 가지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지주사가 은행 이외 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고,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모든 금융사를 보유할 수 있다. 한국 기업만 43년 전에 생긴 족쇄에 매여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경제계 관계자는 “금산분리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다”며 “정부가 각종 규제를 세계적인 수준에 맞춰 완하하고 있는 만큼 금산분리 관한 논의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계에선 반도체 분야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의 성공 모델이 구축되면 이는 조선업 등 다른 국가 전략산업에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 관계자는 “다른 국가 전략산업에도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검토를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 시 생기는 문제점 등을 파악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규제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에 나설 전망이다. 김 실장은 “(금산분리 완화 시) 독점 폐해 등을 막을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가운데 현행 규정을 재검토하라는 게 이 대통령의 지시”라며 “논쟁적인 주제라 사회적 합의, 당이나 정부 내 협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는 이유에 대해 김 실장은 “반도체와 조선업은 산업 정책, 제조업, 실물 경제에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며 “새로운 시대 환경에 맞춰 기존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이 같은 반도체, 에너지 메가 프로젝트에 조인트벤처(JV) 형태로 투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렇게 전향적인 태도를 취한 것은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이 직접 요청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이 화답했기 때문이다. 앞서 최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지난달 10일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 대통령에게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기업인이 말씀하신 것을 이 대통령이 귀담아들은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