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으로 공공 정보화와 같은 공공 소프트웨어(SW) 개발 사업 입찰의 경우 기술(품질) 비중 80%, 가격경쟁력 비중 20%가 평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반면, 서버, 데이터센터 건설 등 하드웨어(HW) 장비 설치 작업은 이 같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 공공물자 조달과 비슷한 기준을 적용받다 보니 소위 '단가를 후려치는' 관행이 만연하다는 우려다.
IT·SW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 위해선 SW 개발뿐 아니라 HW에도 어마어마한 기술이 들어가지만, 이에 대해선 인정이 잘 되지 않는 편"이라며 "데이터센터는 HW와 SW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돌아가는,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면 결국 싸구려 시스템만 들이게 되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대기업 독주 방지를 목적으로 운영돼 온 분리발주도 관행도 향후 사고를 키울 수 있는 요소로 지적된다. '쪼개기 발주'로도 불리는 분리발주는 하나의 전산망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분리해 사업을 입찰하고 맡기는 방식이다. 분리발주가 공공IT사업 계약·작업 기간 장기화, 프로젝트 유찰 빈도 증가, 사고 발생 시 불분명한 책임 소재 등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저가입찰제, 분리발주와 같은 제도나 관행으로 전문적인 민간기업이 공공IT사업에 참여하길 꺼린다면 결과적으로 품질 좋은 인프라를 구성하기도 힘들다는 얘기"라며 "참여하더라도 비용·시간 절감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짚었다.
이외에도 공공SW사업 품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대기업 참여 제한 완화, 적정대가 산정 방안 등도 답보 상태다. 지난 정부에서 700억원 이하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 개방을 추진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폐기, 22대 국회에서도 계류 중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보망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무슨 일을 하나'라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 국정자원 화재로 이런 인식이 조금은 개선되지 않을까 싶다"며 "내년도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자정부 관련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단발성 땜질 예산에 그쳐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주 AI안전연구소장은 "2010년경 전자정부가 2~3년 간 세계 1위를 했을 때처럼 충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들여서 1등을 유지할 수준을 지탱해야 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줄면서 시설 노후와,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진 것"이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땜질처방식의 예산으로는 근본적으로 사고를 막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김 소장은 "공공인프라는 보수·진보를 떠나 어떤 정권이든 쓰게 돼 있다"며 "초당적인 협력을 통해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 플랜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데이터센터 기획부터 SW와 HW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처나 조직 재정립 필요성도 떠오른다. 현재는 관련 예산 편성(기획재정부), 시설운영(행정안전부), 정보보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기능이 흩어져 있는 탓에 인프라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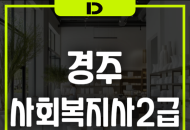



.jp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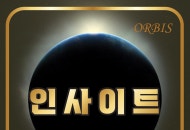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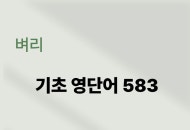


.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