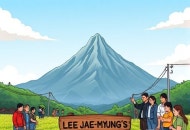이번에 규제지역 들어간 곳
퇴거자금 LTV 70→40%
임대인 보증금 못돌려줘 비상
1주택자 전세금 올려 연장때도
대출이자 전체에 DSR 적용
전세대출 못받는 가구 속출할듯
새롭게 규제로 묶인 지역의 전세가율은 40%를 훌쩍 넘는다. 이에 다수 임대인들이 전세보증금 반환에 곤란을 겪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1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현재 시중은행 대부분은 대출 창구에서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포함된 곳의 전세퇴거자금대출은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이 완료됐더라도 LTV 70%가 아니라 40%가 적용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정부는 10·15 대책 발표 당시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LTV를 40%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기준을 따르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6·27 대책 때 발표된 경과규정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당국의 세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는 한 보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LTV가 40%로 축소되면 통상 전세보증금보다 대출한도금액이 작아진다는 점이다. 이번에 새롭게 규제지역으로 추가된 주요 지역의 전세가율을 보면 △서울 52.3% △과천 49.7% △성남 51.3% △용인 66.8% △하남 61.2% 등으로 대부분 50~60%대를 기록하고 있다. 10억원짜리 주택이면 전세가가 5억~6억원 수준인 셈인데, 전세퇴거자금을 최대한 받아도 4억원 이하로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난 6월 27일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어놓고 안심하고 있던 상당수 임대인들이 전세 보증금 반환 시기에 즈음해 경과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걸 통보받고 당황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입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경과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은행권과 협의해 세부지침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10·15 대책에 따라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만기 연장하는 경우에도 증액 등에 상당한 제약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세대출금이 증액된다면 증액분이 아닌 대출금 전체의 이자상환분이 DSR 적용대상이 된다고 금융위가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10·15 대책은 대출수요 억제책의 일환으로 1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DSR에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서 전세대출 연장은 예외로 해주기로 했지만, 증액이 되는 경우는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는 게 금융위 방침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2억원의 전세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5000만원을 추가 대출하는 경우 5000만원이 아닌 2억5000만원에 대한 이자상환분이 DSR에 적용되는 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단순 만기연장은 신규대출로 안보지만, 증액을 할 경우 금액 전체를 신규대출로 취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최근까지 37주 연속 오름세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 전셋값은 최근 2년 사이 약 6435만원(상반기 기준) 급등했다. 더욱이 공급부족으로 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목돈이 없는 한 전세대출을 증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럴 경우 기존엔 없던 수억 원대 대출금액에 대한 이자분이 DSR을 적용받게 되면서 전세대출 증액을 못 받는 가구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매일경제가 시중은행을 통해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연봉 5000만원이면서 주담대 3억원을 보유한 1주택자는 단 3500만원의 전세대출만 갖고 있어도 전세계약 만기 시 대출 증액이 불가해진다. 증액하려는 순간 기존 전세대출이 DSR에 적용돼 한도(40%)를 꽉 채우기 때문이다.
지방 1주택을 보유한 한 서울 아파트 세입자는 “대책 발표 후 은행에 가 내 DSR을 계산해본 결과, 증액 대출이 불가할 것이란 안내를 받았다”며 “석 달 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데, 지방에 있는 집을 팔거나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란 말을 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해당 규제는 당장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21/0005576710_001_20251021210910798.png?type=w860)






















































.pn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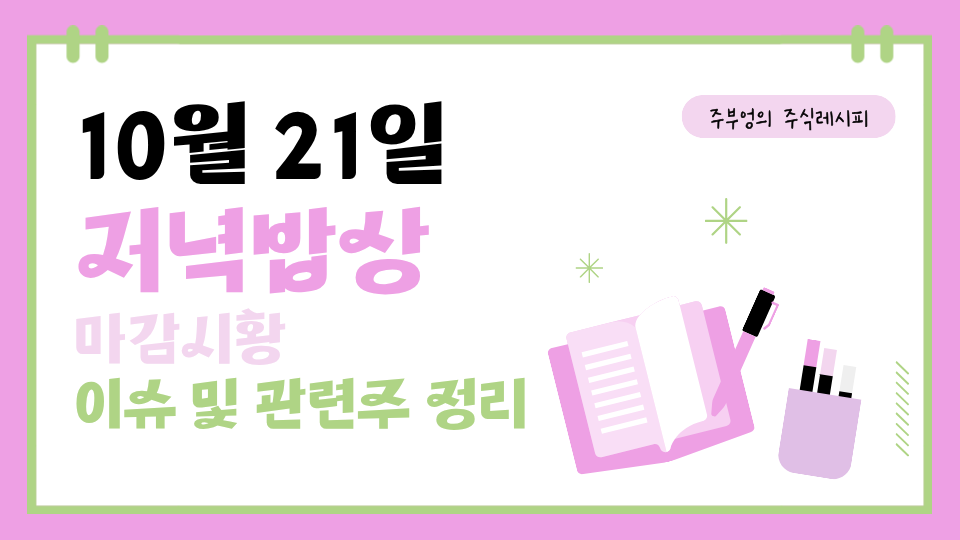.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