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화하면 車·반도체 타격
리튬·실리콘 비축분마저 저조
日은 중국 의존도 크게 낮춰
"비축 늘리고 수입 다변화해야"
중국 상무부가 전략광물인 희토류 수출통제를 다시 강화하면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마그네슘·몰리브덴·텅스텐 등 주요 희소금속의 중국 의존도는 대부분 90%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의존도는 국내 사용분 대비 중국 수입량의 비중을 나타내는 수치로, 핵심 원재료를 중국에 기대고 있다는 뜻이다.
금속 종류별로 살펴보면, 내화물이나 제강보조재로 많이 사용되는 산화 마그네슘의 경우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총 16만579t을 수입해 91%를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량합금이나 자동차·IT 부품으로 많이 쓰이는 마그네슘 금속은 전체 사용분의 99.9%인 2만1304t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항공·모빌리티 소재로 많이 쓰이는 마그네슘 합금 역시 71%에 달하는 6832t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와 특수강 첨가재로 사용되는 몰리브덴 금속 역시 적은 양이지만 전량에 가까운 104t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다. 반도체·항공·방산 등 분야에서 내열 소재로 쓰이는 탄화 텅스텐의 경우 93%에 해당하는 1293t을, 초경합금이나 절삭공구 소재로 쓰이는 산화 텅스텐은 81%에 달하는 1981t을 중국으로부터 각각 수입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비축분이다.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코발트 비축량은 목표량인 100일분 대비 57.8%, 리튬은 30%, 실리콘은 19.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경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희소금속센터장은 "지난 9일 중국 상무부가 수출을 제한한 희토류는 광케이블, 의료장비, 레이더 등을 만드는 미국 산업을 겨냥한 것"이라면서 "지금 당장은 한국 산업에 영향이 작을 수 있지만, 미·중 갈등이 격화되면 중국이 텅스텐, 마그네슘 같은 희소금속도 제재 대상에 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희토류 수출제한으로 광케이블, 의료장비 등의 공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희소금속 비축량을 확보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금속의 비축량을 밝힐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상당한 비축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희토류처럼 부존량이 없는 금속까지는 아니어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원료는 자급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학계 관계자는 "한국 기업들이 원료를 만든다고 해도 중국과 경쟁이 돼야 하는데 시장성이 없으니 자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수입처 다변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본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이후 조달처를 다변화하기 위해 해외 광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결과 중국에 대한 희토류 의존도가 2008년 90.6%에서 2020년 57.5%까지 줄었다.
[강인선 기자 / 지혜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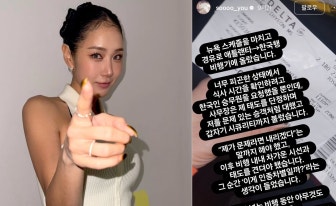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