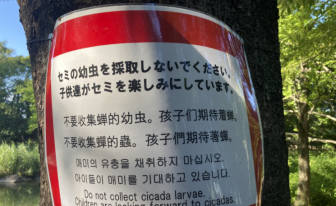지난 6월 마지막주에 저는 기다리고 기다리던 북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여행지는 에스토니아 탈린이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도시일텐데요. 여름 휴가지로 어울리는 고풍스럽고 예쁜 도시였습니다.
옛 소련의 정취가 남아 있는 올드 타운과 IT(정보기술)기업이 들어선 뉴 타운이 잘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순록 고기를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옷을 입고 가져다 주는 점원이 있는 전통 식당도 신기했고요. 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미술관도 좋았습니다. 탈린의 미술관을 만나보겠습니다.
에스토니아 미술관(The Art Museum of Estonia)은 1919년 설립된 에스토니아의 국립 미술관 네트워크입니다. 5개의 미술관을 운영하는 이 미술관의 공간들은 탈린 중심부에 옹기종기 모여있더군요.
중세부터 바로크 시대까지의 역사적 교회 미술은 니굴리스테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고, 16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해외 미술은 카드리오르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요하네스 미켈의 미술 컬렉션은 미켈 박물관에 전시되고 있었고, 20세기 모더니스트 에스토니아 예술가 아담슨-에릭의 예술은 아담슨-에릭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었죠.
시간이 부족한 여행객들이 주로 찾는 곳은 18세기부터 오늘날까지의 에스토니아 미술을 소장한 쿠무 미술관(KUMU Art Museum)입니다. 에스토니아가 독립한 이후 1993년 공모를 시작해 2006년 완성된 신축 건물이라 반짝반짝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현대 미술관의 역할을 하는 이 공간은 멀리서 보면 청록색의 배처럼 보이는 독특한 외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좌우가 길쭉한 반달 모양의 미술관 내부에 들어서니, 1층 그레이트홀에서는 동시대 미술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고 2층부터는 상설전시가 펼쳐졌습니다.
상설 전시는 3층에서 시작되며, 18세기와 19세기의 발트해 독일 예술 유산과 20세기 전반의 에스토니아 민족 예술에 대한 개요를 만날 수 있습니다. 4층에서는 소련 에스토니아 미술과 1990년대 미술이 전시됩니다. 상설 전시장에는 여러 프로젝트 공간도 포함되어 있었죠. 5층에는 현대미술관이 있으며, 정기적인 기획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팝 음악, 고전 미술이 다재다능한 작가의 손끝에서 하나로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격변에서 영감을 얻는 예술가는, 먼저 6개의 스크린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 미디어가 관람객을 둘러싼 원형의 공간으로 초대하더군요. <내일은 없다(No Tomorrow)>(2022)는 기타를 든 여인들이 아름다운 목소리로 합창을 들려줍니다. 폭력이 만연한 상황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을 몸짓과 음악으로 표현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 회화가 맞은편에 걸려 있더군요. <아카디아의 평일들(Weekdays in Arcadia)>(2025)은 화산섬인 아이슬란드의 이국적 풍광 속에 점점이 박힌 인물이 숨어 있는 작품이었는데요. 무척 이국적이었습니다. 상설 전시장에도 그의 영상 작업이 숨어 있는 점도 재미있었습니다.
캬탄손 예술의 모티프는 사랑, 정체성, 우울, 남성성, 힘, 무력감이라고 합니다. 페미니즘 미술과 고전적인 풍경화가 대화를 나누고, 무자비한 자기 비판과 권력에 향한 조롱 등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그는 보여줍니다. 미술사의 관습을 비틀고 탐구하는 아이슬란드 작가와의 만남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다민족 역사는 미술관 속에서 생생하게 드러납니다. 에스토니아, 발트해 독일, 러시아전통의 유산이 혼재한 에스토니아 예술은 그들의 정체성을 증언하고 있었죠. 이름도 낯설고 화풍도 낯선 이들 속에서 기억에 남는 예술가 몇명을 발견한 것만으로도 보람은 있었습니다.
이 시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는 러시아 풍경화가 등장합니다. 이탈리아 전통을 뒤로하고 이들은 목가적인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죠. 에스토니아와 강한 유대감을 가진 이 예술가들에게 에스토니아의 풍경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들은 19세기 후반 바다와 해변을 이례적인 방식으로 그렸습니다.
낭만주의 화가처럼 거칠고 장엄한 화풍이 아니라, 고요한 해변과 작은 만을 그렸죠. 이 시기 대표 화가였던 오이겐 뒤커는 특유의 낮은 지평선을 묘사했고, 사람들은 이를 ‘뒤커의 지평선’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희미한 빛이 반사되는 잔물결을 그렸습니다. 그의 캔버스 속에서 농촌 생활은 행복하고 목가적으로 묘사됐습니다. 북유럽 풍경과 발트해를 포착하는 그의 그림은 전통과 아방가르드 사이에 위치했죠. 에스토니아는 이 화가를 사랑했습니다.
20세기로 접어들면 소비에트 예술이 지배적인 시기가 나타납니다. 선전물처럼 메시지가 명확한 사실주의 화풍이 등장합니다. 일리야 레핀이 그린 사회주의 선전물 같은 그림들의 시대를 뒤로 하고, 이 엄혹한 땅에도 모더니즘이 꽃을 피웁니다.
마지막으로 쿠무 미술관에서 가장 존재감이 큰 예술가는 콘라드 마기(Konrad Mägi, 1898~1905)입니다. 콘라드 마기는 에스토니아를 넘어 북유럽 최초의 모더니스트 화가 중 한 명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을 도시에서 보냈음에도 그의 작품 속에서는 자연이 신비롭고 형이상학적으로 묘사됩니다. 혁명 운동에도 참여했지만 이후에는 예술에 매진했고, 에스토니아 최초의 예술학교 팔라스 아트 스쿨의 초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말을 보면, 그에게 예술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술은 유일한 탈출구입니다. 예술 안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의 풍경화는 특히 자연의 색채와 빛을 독특하게 해석하는데, 이로인해 야수파 화풍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열정적인 영혼의 소유자였던 그의 색채와 붓놀림에서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강렬한 빨간색, 보라색, 노란색을 사용해 엄청난 깊이감을 만들어내죠. 그에게 색채는 자신의 감정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을 향하는 수단이 됩니다.
이밖에도 올가 테리를 비롯한 모더니즘 화가들의 풍경화가 정말 많았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핀란드나 노르웨이 화가의 그림을 보는 것 같기도 하더군요. 빙하가 떠 있는 바다가 낮은 채도로 은은하게 묘사된 그림 속 풍경은 평화로우면서도 어딘가 음울합니다. 이 도시에서 겨울을 경험해본다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런던에서 만나고 온 유럽 미술관 도장 깨기를 서울에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 김슬기 기자가 유럽의 미술관과 갤러리, 아트페어, 비엔날레 이야기를 매주 배달합니다. 뉴스레터 [슬기로운 미술여행]의 지난 이야기는 다음 주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https://museumexpress.stibee.com


![Ragnar Kjartansson [No Tomorrow], 2022 ©김슬기](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03/0005569209_003_20251003094213762.png?type=w860)
![Ragnar Kjartansson [Weekdays in Arcadia], 2025 ©김슬기](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03/0005569209_004_20251003094213873.png?type=w860)


![Eugen Dücker [Coastal landscape(Fishermen going home)], 1841 ©김슬기](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03/0005569209_007_20251003094214024.png?type=w860)
![Oskar Kallis [Linda Carrying a Rock], 1917 ©Kumu](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03/0005569209_008_20251003094214075.png?type=w860)
![Konrad Mägi [Portrait of Elsi Loo], 1915 ©Kumu](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10/03/0005569209_009_20251003094214152.png?type=w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