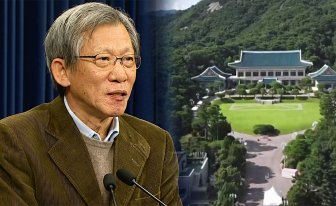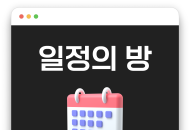솔 펄머터·존 캠벨·로버트 매쿤 지음
노승영 옮김, 위즈덤하우스 펴냄, 2만3000원
솔 펄머터 UC버클리대 교수는 2011년 우주 가속 팽창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 수상한 물리학자다. 그는 2011년부터 개인이 대처하기 힘든 복잡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판단하는 법을 가르치는 수업을 개설했다.
철학자 존 캠벨,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매쿤과 함께 그가 연 학제간 수업의 이름은 '원대한 사상(Big Ideas)'이었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골고루 가르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집단과 협력해 대처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는 수업이었다. 이 책은 오늘날 사회가 길을 잃고 있는 이유를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모순적 정보가 쏟아지는 '정보 과잉' 문제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과학자들은 마스크 사용 여부, 백신 접종 등 문제에 대해 온갖 다른 조언을 내놓았다. 바이러스의 정체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이조차 거의 없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효과 있는 정보를 찾는 과학적 접근법이었다.
과학적 접근법은 우선 두 가지 절차를 요구한다. 첫째, 무엇이 사실인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어떤 사안에서 누구의 전문성을 신뢰할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응급환자에게 투약할 것이냐, 수술할 것이냐' 같은 생사를 가르는 결정을 우리는 다수결로 정할 수 없다. 가장 적합한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편이 더 나은 결정을 낳는다.
저자들은 결정의 위험을 줄이는 '확률론적 사고', 데이터 속 의미와 잡음을 가려 정확도를 높이는 '신호와 잡음의 구분' 등 실용적인 방법론도 알려준다. 게다가 소행성 충돌이나 파국적 기후변화 등 과학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지 못할 난제도 앞으로의 새로운 천년에 등장할 수 있다. 과학에 더해 '낙관주의'가 필요한 이유다.
낙관주의가 풀어낸 난제의 대표적 사례는 페르마의 정리다. 358년간 수학자들은 끈질기게 도전해 1995년 이 문제를 풀었다.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한 페르마가 여백에 쓴 메모 덕분이었다. '할 수 있다'는 과학적 낙관주의는 실제로 전자공학이나 DNA 연구 등 셀 수 없이 많은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저자 펄머터와 연구진은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수십 개의 원거리 초신성을 찾아나섰다. 이들은 3년 동안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 5년 뒤에야 첫 발견을 했고, 10년 만에 답을 찾았다. 과학적 낙관주의가 그들을 절망 속에서도 계속 나아가게 한 원동력이었다.
[김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