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의 달항아리·분청사기
김환기 송현숙 박영하와 조화
로와정 박광수 등 젊은 미술도
그림 속 달항아리 뒤에서 고개를 내미는 보름달은 무엇이 달인지, 달항아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닮아있고, 밤의 어스름을 반사해 시리도록 푸른 빛을 띈다. 조화로운 그림 아래로 고졸한 자태를 뽐내는 조선 흑자 편호가 놓여있으니 제법 잘 어울린다. 철분이 다량 함유된 유약이 빚어내는 검은 빛은 백자의 맑고 투명한 정신과 달리 심연처럼 깊은 세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흙이라는 소박한 재료를 통해 한국적 미학을 탐구하는 기획전시가 열린다. 삼청동을 대표하는 한옥 화랑 학고재에 달항아리를 비롯한 조선의 도자와 한국의 회화가 풍성하게 걸렸다. ‘흙으로부터’는 9월 13일까지 신관과 본관에서 김환기 송현숙 박영하 이진용 박광수 로와정 지근욱 등 7팀의 작가를 소개한다. 신구세대 작가가 각자의 방식으로 한국적인 미를 재해석했다. ‘프리즈 위크’를 맞아 해외 관람객에게 한국 미술의 정수를 보여주겠다는 야심찬 시도다.
이번 전시는 조선시대 도자기에서 출발한다. ‘하얀 백토로 분장한 회청색 자기’를 뜻하는 분청사기는 여말선초 국가적 전환기인 15세기 시대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미의 형식으로 등장했다. 본관 전시장 입구부터 율동이 깃든 문양이 그려진 ‘분청자 초엽문 편병(粉靑瓷 草葉文 扁甁)’ 옆에 박영하의 ‘내일의 너’가 걸렸다. 호주 고대 원주민 미술에서 쓰였던 천연 안료를 복원해 신성한 생명력을 표현한 대작이다. 대지의 색을 그대로 표현한듯해 분청사기 미학과 맞닿아 있다.
본관 전시장의 끝에서 이진용은 목판활자를 활용해 거대한 설치 작업을 보여준다. 나란히 전시된 표형문자입주병에는 술의 정취를 노래하면서도 탐욕이 과하면 흉기가 될 수 있다는 절제의 미덕이 병에 새겨졌다. 최근에서 일본에서 환수된 18세기 보물급 도자다.
신관에 전시되는 1980년대생 세 작가의 반격도 만만치 않다. 박광수는 강렬한 색채의 사용이 돋보이는 ‘땅과 화살’ 등 5점을 걸었다. 작가는 “오랜 작업의 주제가 자연의 소멸과 영속성이었다. 인간과 숲이 함께 존재하는 그림을 통해서 ‘흙으로부터’의 주제를 재해석했다”라고 설명했다.
듀오 작가 로와정은 지하 1층을 텅 비워놓고 에이미 와인하우스의 음악이 흐르는 방에서 , 멀리서 보면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작은 못을 박아 만든 작업을 선보였다. 못과 십자, 일자 나사를 통해 ‘3+1x2÷2-4’라는 수식을 표현한 작품은 가까이 다가서야만 볼 수 있다. 계산식의 값이 ‘0’인 이 작품은 물질주의의 세상에서 비어 있음(空)의 상태가 대지와 같다는 꺠달음을 준다.
지근욱은 특유의 색연필로 망점을 찍고 선을 섬세하게 그린 추상화를 통해 우주를 상상하게 만든다. 중력에서 풀려난 입자가 빛으로 환원되는 연금술적 순간을 포착한 그림이다. 지근욱은 “흙은 광물과 미네랄의 입자라는 생각에서 구상을 시작해 상상력의 범위를 넓혔다. 색연필 선을 그리고 위로 재료를 덧입혀 물성에 대한 결핍을 해소하는 작업을 해봤다”라고 설명했다.
신리사 전시팀장은 “전통을 복원하거나 ‘한국적인 것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단일한 해답을 제시하기보다, 흙을 매개로 우리가 지닌 고유한 감성과 상상력을 되살리고 확장하는 장을 마련하기를 시도한다”라고 설명했다.
![김환기 ‘항아리’와 흑자편호가 나란히 전시되고 있다. [학고재]](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25/0005546881_001_20250826131407884.jpg?type=w860)
![김환기 달과 산(왼쪽), 백자팔각병, 송현숙 ‘5획’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학고재]](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25/0005546881_002_20250826131407931.jpg?type=w860)
![분청자 초엽문 편병과 나란히 걸린 박영하 ‘내일의 너’ [학고재]](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25/0005546881_003_20250826131407977.jpg?type=w860)
![송현숙, 이진용, 박영하이 걸린 전시 전경. [학고재]](https://imgnews.pstatic.net/image/009/2025/08/25/0005546881_004_20250826131408018.jpg?type=w8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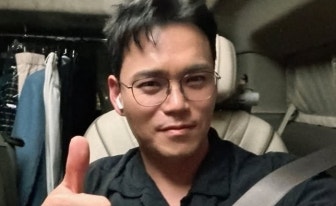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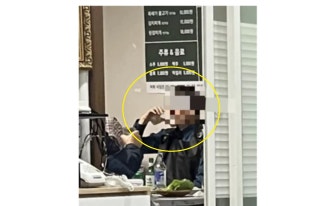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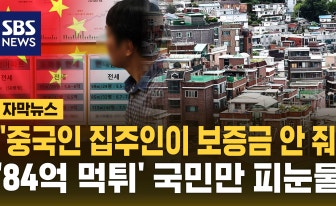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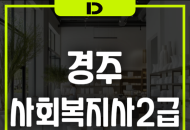



.jpg?type=nf190_1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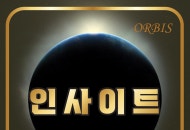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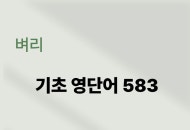


.pn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