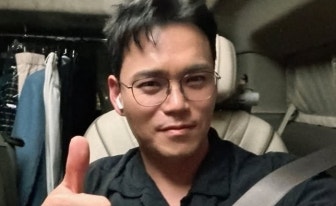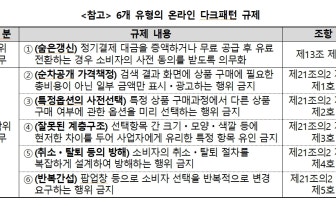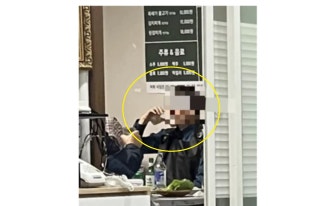특정 업체 독식 현상도 발생해
사이버 보안 사고가 크게 늘면서 공공수요도 커지고 있지만 공공입찰 낙찰가가 지나치게 낮아 업체에는 매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나마도 일부 업체가 수주를 대부분 차지해 신생 업체의 공공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매일경제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구축, 보안 관제를 비롯한 보안 관련 공고의 낙찰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433건의 낙찰 중 149건(34.4%)이 낙찰가 1억원에 못 미쳤다. 올해도 6월까지 총 90건의 낙찰 중 1억원 미만인 낙찰이 33건(36.7%)에 달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서비스 수준이나 기술 혁신성, 인건비 등을 고려할 때 만족스러운 가격이 아니다”며 “낙찰 가격이 계속 하락하면서 서비스 품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더 큰 문제는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덤핑 수주, 저가 수주가 판을 치는 것이다. 공공수요는 늘고 있지만 공공기관은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원하고, 계약을 따내려는 업체들이 물밀듯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저가 투찰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다.
나라장터에 따르면 투찰률 100%가 안 되는 낙찰이 지난해 239건으로 55.2%에 달했다. 올해도 6월까지 56건(62.2%)이 투찰률 100%에 못 미쳤다. 투찰률이 100%가 안 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제시한 가격보다도 낮은 가격에 낙찰이 됐다는 의미로 ‘덤핑 수주’를 했다는 얘기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 예산에 한계가 있어 낮은 가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고, 위험성 때문에 기존에 낙찰받은 업체들과 다시 계약하고 싶어한다”며 “신생 보안업체는 입찰 참여 유인이 떨어지는 데다 참여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에서 대형 업체에 밀려 낙찰받기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영웅 전 우송대 IT보안학과 교수는 “보안 솔루션을 기술적으로 평가하는 위원회를 통해 납품 이후 실제 성과 평가를 다음 입찰에 반영하고, 입찰 담합을 방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전 교수는 이어 “스타트업 같은 신생 기업의 성장을 위해 ‘창업 7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 트랙’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