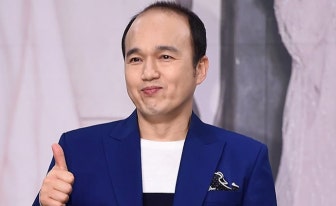무엇이든 처음은 각별하다. 보이스피싱 기사의 첫 취재원 역시 그랬다. 전 재산을 빼앗겼다는 50대 후반의 남성 취재원은 피해자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무덤덤하고 의연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를 가족 이야기를 꺼내자 결국 "죽고 싶다"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단지 첫 취재원이라서가 아니었다. 사기 피해자의 고통을 눈앞에서 그처럼 절감한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피싱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며 불특정 다수에게 소액을 노리던 과거와 달리 사기에 취약한 표적을 정해 고액을 탈취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이에 올해 연간 피해액이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피싱범의 주요 표적은 가정을 이끌고 있는 50·60대 가장들이다. '그놈 목소리'에 넘어가는 가장이 나올 때마다 한 가정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범죄 대응은 여전히 안일하다. 우선 기업은 눈앞의 비용 관리에만 열심이다. 수사기관은 기술적 이유로 더디게 수사를 이어갈 뿐이다. 그렇게 수많은 범죄 징후가 묻히고 피해자들의 호소가 이어지는 동안에도 범죄조직은 같은 통신망을 이용해 수천 개의 가정을 파괴했다. 더는 구시대적 대책으로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고통의 목소리를 많이 들어서 우리가 무뎌진 것은 아닐까. 언제까지 보이스피싱이 대한민국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두고만 봐야 하는가.
해법은 세 갈래다. 먼저, 형사소송법을 손봐 통신사가 조건부로 메타데이터를 실시간 제공하도록 해 수사기관과 기업의 공조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음으로 디지털 포렌식과 인공지능(AI) 분석이 가능한 특수수사대를 경찰 내부에 독립 라인으로 배치해 수사 인력의 혼선을 끊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업과 수사기관이 언제든 범죄 대응 체계를 시험하고 연습할 샌드박스를 상설화해 범죄 수법과 수사 간 기술 격차를 좁혀야 한다. 한번 무너진 삶은 쉽게 복구되지 않는다. 피해자의 고통이 단지 통계 속 숫자로 굳어지기 전에 발 빠른 대처가 시급하다.
[김송현 사회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