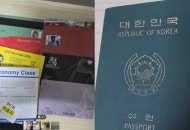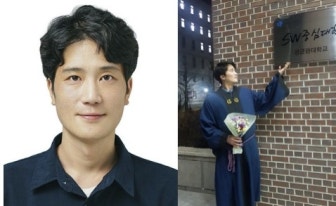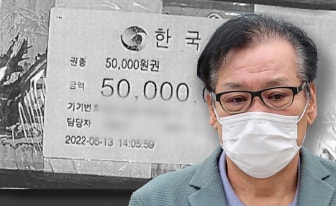신규주택 가격만 하락한 게 아니었다. 올해 3분기 부동산 개발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3.9% 급감했다. 신축주택 판매면적과 판매액도 같은 기간 각각 5.5%, 7.9% 줄었다. 국가통계국은 3분기 전체 고정자산 투자가 0.5% 감소했는데 부동산 개발 투자를 제외할 경우 고정자산 투자는 3% 증가한다며 부동산 경기 둔화가 뼈아팠단 점을 시사했다. 국가통계국은 물론, 로이터 등 서방 외신도 이 같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중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5%를 넘기지 못한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차이신은 지난해 9월24일 중국이 내놓은 대대적 금융완화 패키지 정책(이하 9·24 정책) 후 핵심 가계자산 중 증시는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를 면치 못하는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9·24 정책은 지준율을 인하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포인트 끌어올리는 등 통화·부동산·자본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부양책이었다. 상하이종합지수와 선전성분지수는 이 같은 정책에 호응해 지난해 9월 저점대비 각각 43.66%, 62.02% 급등하며 부동산 시장과 대조를 이뤘다.
부동산 시장도 9·24 정책 발표 뒤 줄곧 둔화된 건 아니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1선 도시(주요 대도시)' 중고주택가격지수는 1.3% 상승했다. 부동산이 증시와 디커플링되기 시작한 건 올해 4월부터였다. 1선 도시의 신규주택 가격은 보합세로 전환되며 이전 4개월간의 상승세가 멈췄고 중고주택 가격은 0.2% 떨어지며 하락반전했다. 이후 1선 도시 신규주택가격과 중고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권에 머물렀다.
이에 당국은 부동산 시장만을 겨냥한 별도 조치를 지속적으로 내놨다. 베이징과 상하이는 소득세를 일정 기준 이상 기간 낸 가구의 경우 도시 외곽지역 주택 구매 제한 수량을 풀었고, 텐진시는 기존 주택 구매 시 주택공적금 인출을 통해 계약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중앙정부 역시 팔을 걷어붙였다. 국무원은 도시 재개발과 연계한 노후 주택 재건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침체는 지속됐다.
차이신은 국신증권 보고서를 인용해 이처럼 각종 부양책에도 부동산 시장만 침체를 면치 못하는 원인을 '소득 기대' 둔화로 지목했다. 이미 소득 증가속도가 떨어져 미래의 집값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국민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것.
소득기대 둔화와 부동산 가격 기대 둔화, 구매 위축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구조가 고착화됐단 설명이다.
기대소득이 낮더라도 한국처럼 토지 부족, 인허가 지연, 재건축 규제 등 원인이 있다면 '소득은 오르지 않더라도, 집은 더 귀해진다'는 심리가 형성돼 '묻지마 사자'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아 부동산 시장이 기대 수익률보다 실제 구매력에 민감히 반응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증시는 딥시크 등장을 계기로 AI 혁신이 새로운 주가 상승 동력이 되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
국신증권은 "2020년 이후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적 변수는 소득기대가 됐다"며 "지난해 9·24 정책 뒤 올해 3월까지 주택가격이 반등한 건 소득기대 개선 때문이 아니라 정책 신호에 따른 단기 반등이었다"고 분석했다. 근본적으로 뾰족한 수가 없어보이지만 중국에선 조만간 새로운 부동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가 확산된다. 중국지수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단기적으로 비관적 시장 심리를 진정시키는게 핵심"이라며 "이미 발표된 각종 정책이 4분기 중 속도감 있게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