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논의가 대표적이다. 제도의 취지 자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다시 경제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일을 막는 사회 안전망 역할도 분명하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여 명 가운데 95만 명 넘게 다시 연체자가 됐다. 세 명 중 한 명이 또다시 빚의 늪에 빠진 셈이다. 이번 조치로는 당장 약 29만 명이 새로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재연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 금융권의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현장의 목소리도 비슷하다. 한 관계자는 "빚을 탕감하는 건 필요하지만, 신용사면은 고민이 더 필요하다"며 "고객이 다시 거래를 시작한 뒤 3~5개월 사이 연체가 쭉 늘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연체자에게 연락하면 '곧 신용회복 신청할 거니 전화하지 말라'는 반응이 늘고 있다"며 제도의 도덕적 해이를 우려했다.
지방 금리 인하 요구도 비슷하다.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 금융사가 수익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방에 환원하는 방식은 충분하다. 실제로 은행을 포함해 금융사는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대출 심사라는 금융의 본질을 무시하라는 요구는 금융을 금융답지 않게 만드는 일이다.
최근 대통령 발언은 이런 우려를 더 키웠다. 지방에 더 싸게 해주라는 주문은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진다. 금융권의 긴장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원리를 거슬러 강제로 금리를 낮추라고 하면 민간 금융사의 혁신이나 경쟁은 설 자리가 사라진다.
금융은 '신용'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자산을 기반으로 한다. 신용은 곧 약속이다. 갚을 능력이 있고 또 반드시 갚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돈이 돌고 시장이 움직인다. 이 질서가 무너지면 금융은 단순한 돈 거래가 아니라 사회 전체를 뒤흔드는 불안 요인이 된다. 빨간불이 답답하다고 무시하고 달리면 도로가 곧 아수라장이 되듯, 금융 질서가 무너지면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장기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저신용자의 금융비융을 조금이라도 낮추고, 국토균형 발전을 하자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선의로 시작한 정책이 시장원리를 거스를때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우리는 과거에도 경험했다.
필요한 순간 쓰는 약은 치료가 되지만 과용하면 독이 된다. 신용사면이나 저신용자 금리 우대, 지방 금리 인하도 일시적 치료제일 수는 있다. 그러나 반복적이고 인위적인 처방으로 굳어지면 상습 복용이 되고 시장 체질을 해치는 독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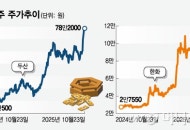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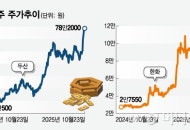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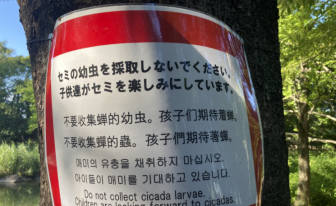





















.png?type=nf190_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