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큰 딸과 중년의 아버지가 마주 앉았다. 딸은 가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고, 아버지는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져 온 가풍과도 같은 남아선호사상에 대해 고백하고 있다. 그런데 그 답이 지나치게 솔직해서 아무런 관계없이 바라보던 사람의 기분마저 좀 떨떠름해질 정도다. 딸이 볼 멘 목소리로 "왜 남동생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돌아오는 아버지의 답은 더 난감하다. "할아버지가 ○○이 어렸을 때 사주를 보니까 거목, 나라의 큰 기둥이 될 거라고 하더라고."
그 장면쯤부터 이 다큐멘터리가 그간 영화와 드라마, 책, 뉴스 등을 통해 너무나도 많이 다뤄져서 자칫 진부한 의제로까지 느껴질 정도인 '가부장제'와 '가족 내 성차별'을 아주 힘 있는 방식으로 다시금 소환하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남자 형제가 있는 집안에서 미묘하고도 분명한 차별을 겪으며 자라온 누나나 여동생이라면, 아마도 작품을 보는 동안 속에서 천불이 일 것이다. '날 것 그대로의 가족 내 성차별 정서'가 곳곳에서 실감 나게 드러나서다.
제목이 '양양'인 데는 이유가 있다. '양 씨 아가씨'라는 뜻이다. 지칭하는 건 양 감독이 아니라, 그의 고모다. 젊은 시절 스스로 목숨을 끊은 1950년대생 고모가 있었다는 걸 양 감독은 다 큰 어른이 돼서야 알았다. 사정이 궁금해 물으니 아버지는 '잘 모르겠다고'만 한다. 대학생이었던 고모의 사망신고 시점이 고등학생 때로 돼 있다는 사실은 더욱 석연치 않다. 사망신고는 고인의 가족이 하는 것이니, 가족들이 그 죽음에 관한 무언가를 감추고 싶어 했던 건 아닐까. 양 감독은 결심한다. 고모의 옛 친구들을 수소문해 만나보기로. 그리고 알고자 한다. 고모 삶의 마지막 장면에 숨겨져 있는 그 어떤 비밀들이, 혹여라도 자신이 오래도록 경험해 온 이 집안의 부당한 문화와 관련된 것은 아닌지를.
'양양'이 무심한 관객의 심정까지도 요동치게 만든다면 그건 오롯이 양 감독이 작품을 통해 보여준 이같은 용감한 태도 덕분일 것이다. 제 밥벌이 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성인은 자기 뜻에 따라 원가족과 거리를 두고 살 수도 있다. 그러나 양 감독은 그러는 대신 관습적인 가족문화에 문제를 제기하고 불편한 것을 바꿔나가 보기로 한다. 가족 묘비에서 빠져 있는 고모의 이름을 다시 새겨주자는 구체적인 제안과 함께. 그건 그로 인해 생겨날 가족들 사이의 고통스러운 불협화음까지도 함께 짊어지기로 결심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양 감독과 같은 성별로 같은 시대를 살아온 여성으로서 그의 용기와 노력이 가족에 대해 얼마만큼 정성스러운 태도를 지녀야만 가능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기에, '양양'의 작업 과정에 진실한 존경을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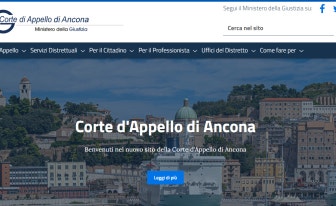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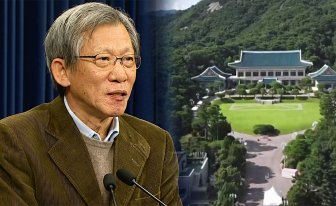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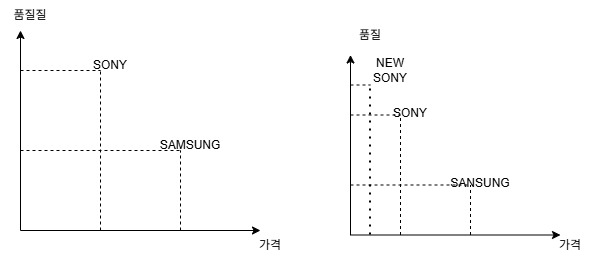.jpg?type=nf190_130)




.jpg?type=nf190_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