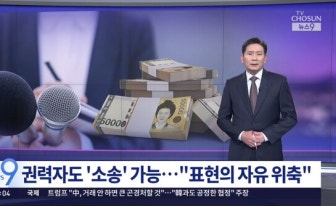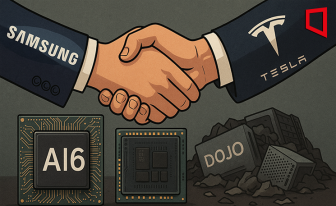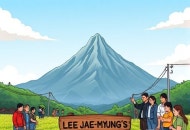박찬욱은 오래된 고정관념과 사회질서에 도전했다. 미디어는 북한 사람을 악마·괴물·빈민과 같은 정형화된 이미지로 주입해 왔다. 그러나 북한 사람도 우리 같은 사람이라는 관점을 '공동경비구역 JSA'에서 사실상 처음으로 드러냈다. 예컨대 우리는 북한군으로 등장한 송강호가 초코파이를 한입에 넣는 장면에서 뭐라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을 느꼈다. 영화 흥행 이후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사실도 우연이 아니었을 것이다. 이후에도 그는 '올드보이'와 '박쥐' 등을 통해 사회적 금기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무조건 새롭게' 앞으로 나아갔다.
배우 이병헌은 그를 "선비"라 말하고, 박정민은 "이상적인 리더쉽"이라고 말한다. 촬영 현장에서 그는 화를 잘 내지 않는다고 한다. 힘든 상황에서도 감정을 내세우지 않는 이유는 과거의 신인 감독 시절 경험 덕분이다. "촬영 중에 좀 화가 났다. 처음 큰 소리가 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조명감독이 팔짱을 끼고 세트 뒤로 끌고 가더라. 딱 한 마디 했는데 '감독이 화를 내면 우리가 감독에 대한 존경이 사라져'. 그 한마디를 했다."
적지 않은 그의 동료들이 20년 이상 오랜 기간을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창작 공동체'라는 인식의 결과다. 그는 촬영 현장에서 모두에게 질문한다. "우리 투표하자. 뭐가 좋냐?" "어떤 거 같아?" 장면과 장면은 배우의 의견을 더해 완성된다. 배우들은 작품에 깊게 참여하는 느낌을 갖고 함께 답을 찾게 된다. 주연배우와 메인 스태프가 아니더라도, 작품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에게나 생각을 물어봤다. 이것은 '존중'으로 연결된다. 송종희 분장감독은 말했다. "작업할 때 동등하게 작업자 대 작업자로 대해주세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줄 아세요? 그 영화에 뼈를 갈아 넣게 됩니다." 정서경 작가는 말했다. "입금이 되기 전까지 한 줄도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는 누구보다 창작자의 노동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를 바랐다. 1990년대 보편적이었던 영화판의 룸살롱 문화도 박찬욱 이후에 사라진 것 중 하나다. 그가 바꿔놓은 촬영 현장도 그의 좌우명이라 할 수 있는 '무조건 새롭게'를 위한 중요한 파트였다.
그에게 중요한 가치는 상업적인 흥행보다 '내 기준에 맞는 영화를 만들었는가'였다. 그는 한 편의 세계를 책임지는 영화감독답게 살아내기 위해 혼자만의 성취를 넘어 그와 함께한 동료들과 성장하는 방식을 택했다. 사람을 도구로 쓰지 않는다고 느끼게끔 행동했고, "예술의 세계에서 안주하는 것만큼 나쁜 것은 없다"며 스스로를 다그쳤다. 동시에 지난해 말 '윤석열 퇴진 영화인 선언'에 이름을 올리는 등 사회적 목소리를 내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았다. 그렇게 박찬욱은 거장이 되었고, 영화계를 바꾼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다.